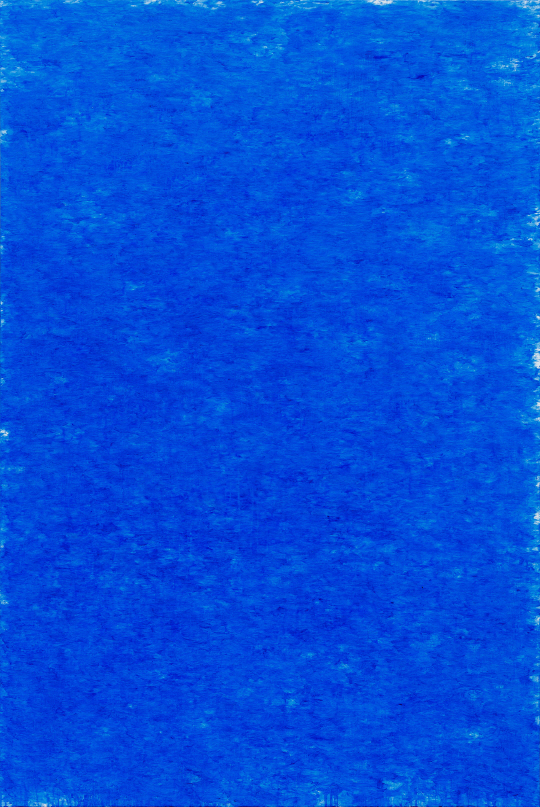지난 2012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의 단색화’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기획전이 열렸다. 1970년대 이후 국내 화단을 이끈 단색조 회화 경향을 보여준 최대 규모의 전시로 김환기·이우환·박서보·정상화 등 31명 작가의 150여 작품이 선보였다. 국내외 미술관의 관심이 일었고 2014년부터는 해외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이른바 ‘단색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후 3년은 그 절정기였다.
◇왜 ‘후기 단색화’인가?=이제 단색화는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다소 주춤한 기색도 포착된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단색화’전을 기획했던 윤진섭 큐레이터는 “가장 선호도 높은 1970~80년대 작품들이 물량적 측면에서 고갈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과 함께 “단색화의 상업적 흥행에 걸맞은 미술비평계와 학계의 담론 부재”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서울 종로구 리안갤러리(대표 안혜령)는 올해 포문을 여는 전시로 ‘한국의 후기 단색화’전을 기획해 5일 개막한다. 1874년 모네·드가·르누아르 등이 주축으로 인상주의를 선보인 이후 1910년 열린 ‘마네와 후기 인상주의’전을 기점으로 세잔·고흐·고갱 등이 주목받았듯 의미심장한 전시다. 이번 전시도 맡은 윤 큐레이터는 “현재 70~80대가 된 원로작가들을 ‘전기 단색화’라 한다면 ‘후기 단색화’ 작가들이란 전기 단색화의 전성기인 1970~80년대 한국미술의 현장에서 모더니즘 미술을 체험한 작가군으로 현재 50~60대 중견이 된 세대”라면서 “이들은 유교적 생활 윤리보다는 합리주의가 몸에 배 있고 일본어보다는 한글과 영어의 구사가 더 자연스러우며 유럽·미국 등 서구에서 미술을 전공한 유학세대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전기 단색화’ 작가들이 수양에 가까운 반복적 행위를 작업수단으로 삼은 것과 달리 ‘후기 단색화’ 쪽은 의식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독자적 재료와 매체 실험을 통해 단색화의 지평을 넓혔다는 경향도 포착된다.
◇누가 후기 단색화를 이끄나=지난 2012년 국현 전시 때도 전·후기 단색화가 나뉘어 소개된 바 있지만 이번 전시에는 11명의 작가가 엄선됐다. 단색화는 색(色)보다 작가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남춘모 작가는 천 염색기법을 쓰거나 나무틀에 천을 깔고 폴리에스테르를 반복적으로 칠해 떠내는 기법 등을 사용해 자신의 의식이 그림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애쓴다. 물감을 손에 묻혀 그리는 김춘수는 몸의 역동성이 다다른 정신적 경지를 ‘푸른색’ 그림으로 보여준다. 무광택 파스텔톤이 고운 장승택의 ‘무제-컬러’ 연작의 이면에는 반복적 스프레이 작업이 주는 극한 고통과 모종의 희열이 뒤섞여 있다. 초기 점(點)을 그리던 천광엽은 반복해 그린 미세한 점을 샌드페이퍼로 갈아낸 뒤 다시 물감 바르기를 거듭한다.
독특한 재료가 작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도 했다. 이배 작가는 나무를 태워 얻는 숯을 소재로 오랫동안 작업해 왔다. 특히 파라핀 위에 숯가루를 섞어 마치 상감기법처럼 활용하거나 작은 크기의 숯을 캔버스에 무수히 붙이는 식의 작업으로 평면과 설치작업을 넘나든다. 반면 이진우는 숯이 놓인 한지를 쇠솔로 두드려 장엄한 분위기의 단색화를 이뤄낸다.
종이에 아크릴물감을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김택상의 작품은 나무에 달린 홍시나 잔잔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고, 천연염료를 사용한 전영희의 색은 깊이감이 남다르다. 김이수가 겹겹이 포개 그린 단색 띠는 마치 수평선 같고, 법관의 작품 속 무수한 빗금은 공존의 세계를 그린다. 특별한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김근태는 선(禪) 수행이나 면벽수도같은 울림을 전한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열린 후 3월8일부터는 리안갤러리 대구로 옮겨 4월14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