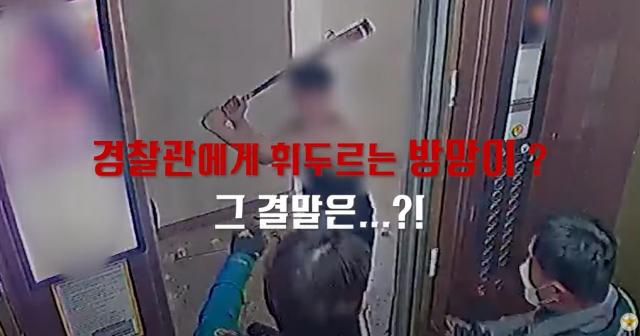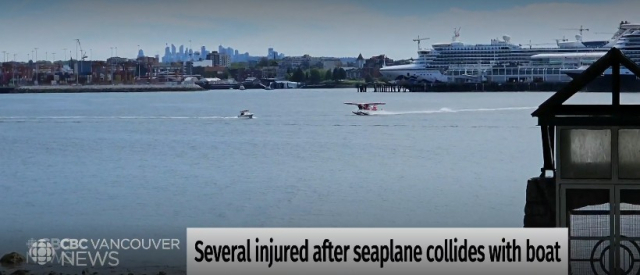치켜뜬 눈과 얽은 피부, 험악한 인상보다도 더 위압적인 것은 화려한 문양의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온몸을 뒤덮은 정교한 용 문신이다. 그는 야쿠자다. 사진작가라며 찾아왔건만 사진 한 장 안 찍고 허구한 날 혼자 술잔만 기울이는 양승우(52·사진)에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밥 먹었느냐” 물었고 같이 밥 먹은 후에는 옥상으로 가 웃통을 벗더니 사진을 찍으라 했다. 그가 한국 혈통의 재일교포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후로 겨울이면 차 한잔 하라, 여름이면 사무실 찬 바람 좀 쐬고 가라며 챙겨주는 사이가 됐다.
신주쿠 가부키초의 살벌한 뒷골목을 배경으로 야쿠자와 노숙자, 유흥가 여성을 비롯해 그곳에서 나고 자라는 어린이들까지 담은 ‘잃어버린 아이(Lost Child)’ 연작은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다. 양승우 작가는 이 시리즈로 지난해 일본 사진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도몬켄(土門拳) 상’을 수상했다. 1981년 제정된 도몬켄 상을 외국인이 받기는 지난해 양 작가가 처음이었고 도쿄·오사카·야마가타에서 순회전이 열렸다. 일본이 먼저 알아본 그의 수상을 기념한 전시가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디프레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1층에는 수상작 40점, 2층에는 ‘청춘길일’ 연작 등 총 80여 점의 흑백사진이 선보였다. 전시명 ‘그날풍경’은 그날의 풍경으로 읽힐 수 있지만 그 ‘날풍경’으로도 해석된다.
차도 휴대폰도 없이 온몸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전시장에 들어선 작가가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건달로 보일 법도 하다. 야쿠자 후계자 지명식,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을 턱 앞에서 찍은 정면 얼굴, 밥 먹고 술 마시는 모습 등 내부 깊숙이 파고든 사진을 찍다 보니 “내 작품 아는 한국 사람들은 ‘양 작가 그 사람 깡패니까 그렇게 찍을 수 있었겠지’ 하더라”고 작가가 토로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려 노력했을 뿐이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공부든 뭐든 시큰둥 했고 그저 놀기만 했다. 모범생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20대는 ‘건달’이었다. 스물아홉 살, 친구들과 무턱대고 놀러간 일본 도쿄가 마음에 들었다. 일본 어학학교에 등록하고 1년간 머물렀더니 “알수록 더 있고 싶은 곳”이 됐다. 사진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비자연장이 필요해 들어간 곳이 시부야 일본사진전문학교였기 때문이었다. “태어나 처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더 노력해 사진으로 꽤 유명한 동경공예대학 사진과에 진학해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학비는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으로 충당했고 콘테스트 상금도 유용했죠.”
유흥가·환락가로 유명한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 작가는 “깔끔하고 정제된 일본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그곳에서는 술 취해 휘청거리고 담뱃불 버리는 흐트러진 모습인데 그게 꼭 한국의 밤처럼 편안했다”면서 “어느 날 받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라는 수업과제 때문에 내가 평소 좋아하던 그 거리로 간 것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금요일 밤에 나가서 일요일 아침까지 (노숙자처럼) 거기서 박스깔고 지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 깡패 5명이 지나가는데 말도 못 걸었죠. 그 걸어오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고 ‘설마 맥없는 사람 무턱대고 때리겠냐, 후회할 것 같으면 몇 대 맞을지언정 말이라도 걸어보자’ 다짐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친 날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느냐’ 물으니 흔쾌히 ‘그래 그러자’ 합디다. 사진 인화해 주러 갔더니 ‘좋다, 괜찮다’면서 사무실에 가자더군요. 그 뒤로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찍힌 사람에게) 꼭 보여줍니다.”
그의 사진은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를 건드리지만 그 어지러운 장면 속에 희미한 인간애를 깔고 있다.
“찍고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냄새’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나같은 냄새가 난다 싶어 그 사람 곁에 다가서는 것은 그 냄새를 찍고 싶어서예요. 더러운 냄새일지언정 향수 내음보다는 이런 사람 냄새가 좋거든요. 그런 냄새가 폴폴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한편 미아리 술집, 나체의 여성 접대부와 뒤엉켜 술마시는 사내들 등의 모습을 담은 ‘청춘길일’ 연작은 친구의 죽음으로 촉발됐다. 깡패로 살며 감옥을 들락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의 소식을 접하고 “나 아니면 누가 이들을, 이 모습을 기억하랴” 싶어 사진을 찍곤 한다. 쓰레기통을 뒤지듯 밑바닥을 긁어 찍은 사진에서 숭고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해 수상 이후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요청이 쇄도하는 작가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사진이 내 생활의 일부지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계절노동자예요. 봄이면 녹차밭 공장, 여름 오면 귤밭에서 일하고 호텔 카페트도 깔고 콩고·말레이시아의 정글을 다니며 유전찾는 일도 합니다. 일하다 문득 사진 안 찍고 뭐하나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대학원 후배로 만난 아내와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힘든 시간을 함께 했다. 지난해 수상 기념(?)으로 가난 때문에 미루던 아이를 가졌고 봄에는 그도 아버지가 된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사진=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