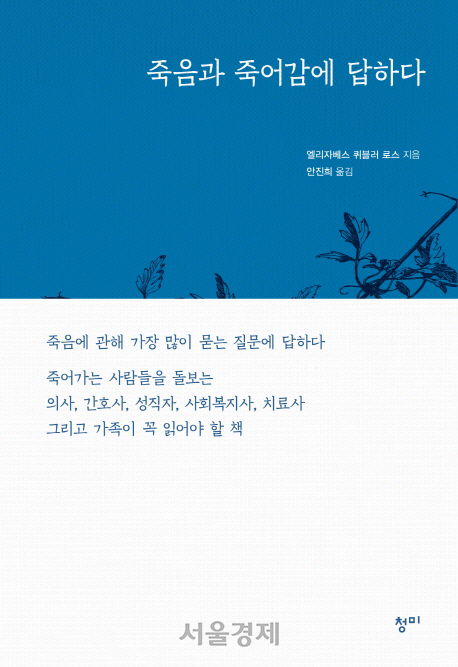‘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
누구나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죽음의 5단계’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은 환자는 보통 처음에는 진단이 잘못됐을 것이라는 ‘부정’의 단계를 거친 뒤 이내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생활 태도를 바꾸면 병이 나을 거라 믿는 ‘협상’의 태도를 보인 후 시간이 더 흐르면 자포자기 상태인 ‘우울’에 빠진다. 여러 단계를 통과한 뒤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잡고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태에 이른다.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는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주창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지난 1974년 출간한 책이다. 로스 박사는 5년 동안 시한부 환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 등을 700회 이상 진행하면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과 이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엮어 책을 펴냈다. 국내에 번역·출간된 것은 지난 198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저서 전반을 관통하는 정서는 다름 아닌 ‘무력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로스 박사는 정신의학 분야의 대가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앞에서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는 “집에서 임종의 순간을 맞고 싶다”는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심지어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는 환자도 말리지 않는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무력감으로 쩔쩔매면서도 로스 박사는 환자의 처지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차분히 곁을 지킨다. 환자의 병을 거뜬히 낫게 하는 신기의 의술을 대신하는 것은 공감의 언어이자 겸손의 태도다. 저자가 “의사는 환자에게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무신경하게 말함으로써 한 줄기 희망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할 때, “환자를 돕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며 세상에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할 일”이라고 읊조릴 때 읽는 이의 마음 한편에서 도리 없이 따스한 슬픔이 차오른다.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는 40여 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난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들어간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로스 박사는 약제 투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임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대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며 연명의료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각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을 뜯어 보면 이 제도가 로스 박사의 견해를 토대로 설계돼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만 유익한 책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시한부 환자의 고통과 그에 대처하는 의료진의 자세를 숙고하는 저서지만 이 책은 어느 순간 ‘죽음과 죽어감’을 넘어 ‘삶과 살아감’에 대한 깊고 진지한 통찰을 안겨준다. 당장 병이 있든 없든, 죽음을 고민하고 이해하며 존재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조용히 일러준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살아감을 위한 교훈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들로부터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