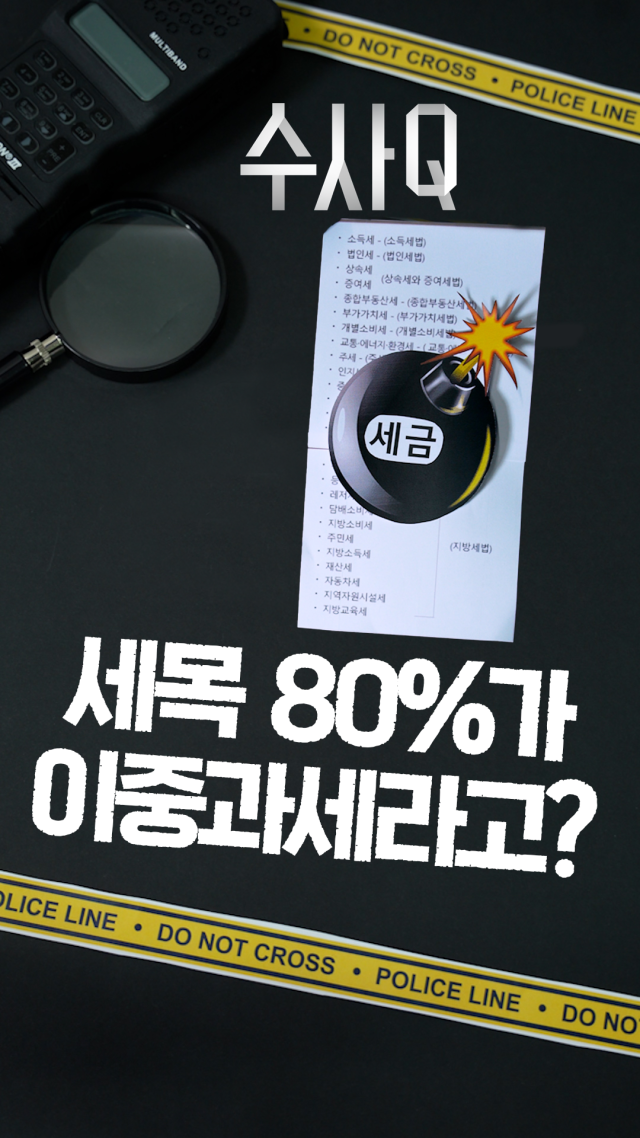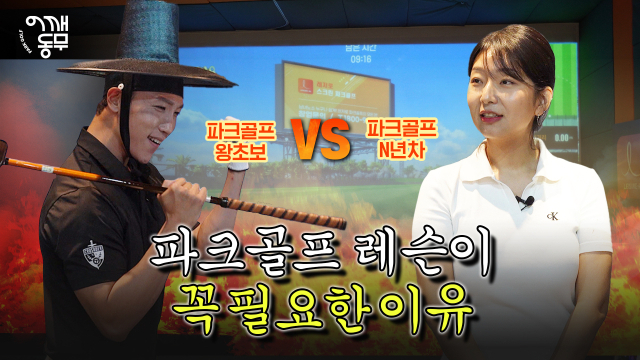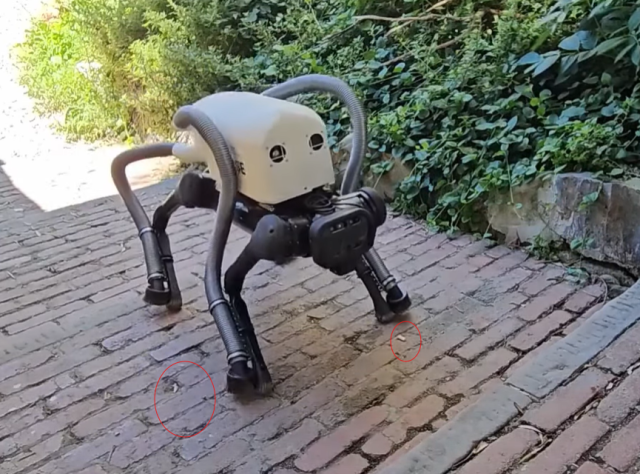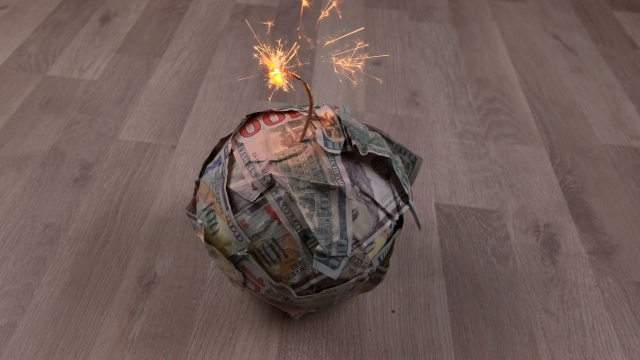지난해 미국 지방법원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 증가를 주도한 곳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였다. NPE는 특허 개발이나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들인 특허를 토대로 일선 생산·판매기업에 싸움을 걸어 소송·라이선싱 등을 통해 돈을 버는 단체나 개인이다.
돈 장사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 특허괴물은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도 삼성·LG·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국제특허 소송을 벌인다. 그만큼 뜯어먹을 돈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NPE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경영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지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NPE들이 기업 소재 관할 지방법원에서만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영향으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을 괴롭혔던 NPE들의 소송 건수도 계속 줄어왔다. 2013년 288건에서 2015년 194건, 2016년 87건으로 감소한 것.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국내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NPE들의 숫자는 107건으로 다시 늘었다. 미국 지방법원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체 건수(182건)의 58.5%를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 특허분쟁 변호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로비력까지 갖춘 NPE들의 소송이 지난해 급증한 것을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NPE들이 활개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은 철저히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지식재산보호원이 2013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총 1,264건의 국제특허분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84.4%인 1,067건이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특허분쟁이다. 이 중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1,007건으로 94.4%를 차지한다. 사실상 일방적인 게임인 셈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지방법원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준사법 기관이나 미국의 무역위원회(ITC)와 같은 세관조치 사건은 제외됐다”며 “국제특허분쟁이 기업 영업비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기업(NPE)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다. 전기·전자는 총 67건(제소 1건 포함)의 특허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36.81%를 차지했고 정보통신이 57건(제소 1건 포함·31.82%), 장치산업 29건(제소 1건 포함·15.93%) 등의 순이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문제를 제기한 의약업종은 미국 업체들과 우리 기업 간의 특허기술 차이가 커 실제 미국 현지에서 피소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미국 기업이나 NPE들이 특허분쟁으로 가기 전 경고장(Warning letter)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이나 NPE들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특허기술 침해 관련 피소를 당한 중소기업은 2014년 24건에서 2015년 6건으로 줄었지만 최근 2년 평균 20여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특허분쟁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렵게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가 특허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특허청은 현재 해외 6개국 12개소에 IP-DESK를 설치해 해외진출을 앞둔 우리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와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