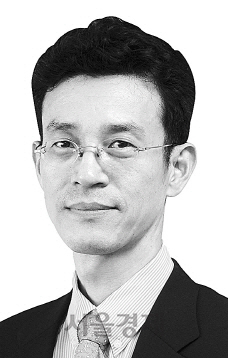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법제화한 때는 2004년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한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 요건을 명문화했다. 전쟁과 자연재해·대량실업·경기침체 등이 담겼다. 이전의 규정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다. 그야말로 ‘묻지 마’ 추경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셈이다. 여야 막론하고 새 규정을 반길 리 만무했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3년이나 걸렸다.
재정 규율을 세우는 데는 참여정부 경제참모 가운데 박봉흠과 변양균 같은 예산통이 많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 못지않게 씀씀이도 관리해야 한다는 나라 곳간 지기의 소신이었던 것이다. 미래를 읽는 혜안이 빛난다.
국회로 이송된 4조짜리 청년 일자리 추경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90번째가 된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란을 넘기 위한 ‘착한 정책’임을 내세우지만 야당은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지체될지언정 무산될 공산은 제로에 가깝다. 왜 그럴까. 추경에는 몇 가지 작동 공식이 있는데 이에 대입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첫 번째는 불패신화다. 추경 역사상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없다. 1987년 체제 이후 숱한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추경 불패에는 예외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취임 첫해 추경이 정례화했다는 점이다. 전 정부가 앞선 해에 편성한 예산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아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추경을 두고 당이 일제히 반대의 포문을 열자 여당에서는 “첫 추경인데 과거 전례 상 야당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이 나온 연유다. 한마디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다.
하지만 추경편성에도 금기가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직전에는 삼간다는 불문율이 그것이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추경을 요청한 전례가 있지만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조차 없었다. 벚꽃 추경도 피한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한 지 얼마 지나서 않아서 예산을 또 늘려달라고 하면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경 공식을 꿰뚫는 맥락은 재정의 정치화다. 여권으로서는 추경은 꽃놀이패다. 민생이 어렵고 실업대란에 아우성인데 야당이 국회 통과를 막는다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선거를 앞두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이번 벚꽃 추경안은 그래서 상궤를 벗어났다는 말이 나온다. 청년실업이 구조적 문제인데도 임시변통에 불과한 추경을 동원한 것도 어색하다.
하나 어쩌랴. 여권이 정 추진하겠다면 결국 관철될 수밖에 없을 텐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투표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추경만큼은 그 정도로 집안 단속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타협책 모색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그러자면 선행해야 할 게 있다. 우선 정부가 선거철 추경에 대해 분명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 올해 예산안 편성 때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것도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고무줄 추경 요건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일이다. 추경 요건 가운데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조항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인 게 89조다. 2004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로서는 추경 남발 제동장치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정치논리로 흘려 고무줄로 전락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대가로 참여정부를 끝으로 균형재정 기조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벌써 11년 연속 적자재정이다. 나라 곳간을 허문 데는 여야 가릴 것도 없다. 이제는 정치 추경을 끝내야 한다. 참여정부를 계승한 정부라면 말이다.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