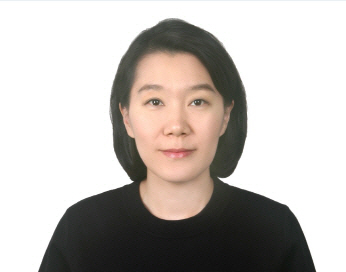지난달 23일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한 편의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성공 스토리로 종종 거론되는” 노르딕(북유럽)국가의 생활 수준이 미국보다 적어도 15% 낮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발끈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 어느 사회가 좋은지 경쟁하면 우리가 항상 이길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많은 이들에게 북유럽 경제모델은 늘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6년 대선 경선 당시 북유럽 사회복지 정책을 미국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거듭 언급했다. 친시장 개혁의 전도사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스웨덴식 사회모델을 “영감의 원천”이라고 추켜세운다. 한국에서도 ‘복지’ 하면 북유럽 모델부터 떠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비전도 북유럽 사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노르딕 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해결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북유럽 팬이 넘쳐나는 것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조화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선진적 복지정책 못지않게 낮은 법인세, 유연한 노동시장 등 친기업 정책으로도 유명하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스웨덴은 보수와 진보 세력의 ‘로르샤흐 테스트(Rorschach test)’로 불리기도 한다. 로르샤흐 테스트란 잉크의 얼룩에 의한 연상실험이다. 진보는 진보 입장에서, 보수는 보수 입장에서 보고 싶은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은 탄탄한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로 소개된다.
물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한꺼풀 벗기면 온갖 사회적 문제와 모순이 뒤섞여 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해 국민들은 비싼 세금을 문다. 스웨덴 국민들이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내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44%에 달한다. 이렇게 팍팍한 세 부담을 감수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쌓기까지 치열한 갈등 논쟁,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부담 고복지’ 구조의 스웨덴 경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과도한 복지정책의 한계가 드러나자 복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세금을 낮추고 공공지출과 복지혜택을 줄였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금개혁에도 성공했다. 지금 스웨덴 모델이 세계에서 각광받는 것은 그 혹독한 변신의 결과다. 그리고 그 모델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급격한 난민 유입과 함께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신뢰 기반의 복지모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국민들은 반(反)난민 극우정당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낸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때로는 과감한 정책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유연성이다. 그것이 성공적인 경제모델의 빛에 가려 간과하기 쉬운 스웨덴의 진정한 강점이 아닌가 싶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꾸린다. 저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 경제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분기점이지만 2기 경제팀은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문 정부가 파랑새를 쫓느라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