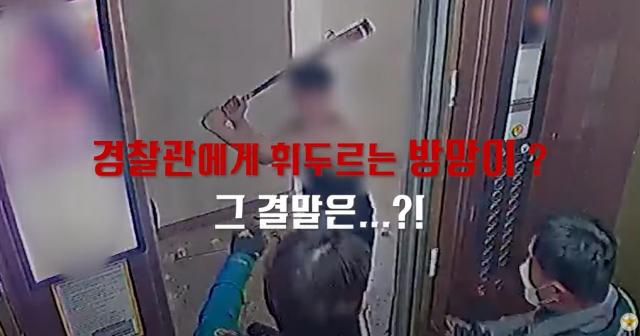총, 하지만 과자로 만든 총이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현대미술가 F.X.하르소노(70)가 1977년에 제작한 설치작품 ‘만약 이 크래커가 진짜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는 한 무더기의 분홍색의 총 모양 과자들이다. 지난 1965년 수하르토 통치가 시작된 후 인도네시아의 예술은 검열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는 젊은 예술가들을 더 자극했고 오히려 사회적 이슈, 실험적 예술이 다양하게 터져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 고운 핑크빛 과자 총은 모르는 사이 일상을 파고든 폭력성을 은유한다.
힘든 시간들은 벅찬 과거가 됐다.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아시아는 탈식민, 이념 대립, 베트남 전쟁, 민족주의 대두, 근대화, 민주화 운동 등 급진적인 사회 변화로 달아올랐다. 권위와 관습에 ‘저항’하는 것이 속성이기도 한 예술가들이 억압 속에서 ‘해방’을 갈구하며 기존 예술의 개념과 틀을 벗어나는 실험적 미술을 시도한 시기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31일 개막하는 기획전 ‘세상에 눈뜨다: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는 이 시기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13개국 100명 작가들을 통해 보여준다. 흔히 현대미술을 서구에서 동양으로 유입된 것으로 여기지만 전시제목의 ‘눈뜨다’를 유념해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아시아의 현대미술이 외부에 의해 자각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주체적인 정치적 자각과 예술 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졌음을 뜻한다. 전시를 준비한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주체성에 대한 자각과 서구 근대주의의 비판은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벗어나 사회 맥락에서 예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미학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미술 운동을 출현시켰다”면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실천은 나라마다 다른 시기에 나타났는데 한국·일본·타이완은 1960~70년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인도 등은 1970~80년대, 중국은 1980~90년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싱가포르 작가 탕다우(66)는 자신이 살던 동네가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되자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9년작 ‘도랑과 커튼’은 땅을 갈라지게 만든 자연 요소를 관찰한 후 가장 넓은 도랑 안에 흰 천 조각 7개를 매단 작품이다. 천 조각이 땅에 닿는 부분을 잉크로 표시한 다음 7개의 천 조각을 10일간 도랑에 묻어뒀더니 흙이나 빗물 스며든 자국이 천을 물들였다. 날씨와 지형에 의해 완성된 작품을 두고 작가는 “내가 재료를 지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재료와 내가 관계를 맺는 데 관심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전위미술가 이승택(77)은 1980년대에 전통적 조각을 거부하며 ‘형체 없는 조각’ 작업을 추구했다. 불·연기·안개·바람 등 자연현상을 작품에 도입한 그의 작품은 뚜렷한 형태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비물질성’이 특징이다. ‘하천에 떠내려가는 불타는 화판’은 일명 보잘 것 없는 회화라고 불렀던 화판에 불을 붙여 한강에 떠내려가게 한 행위미술의 기록이다. 기존 미술 관습에 대한 강한 저항이 읽힌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 ‘구조를 의심하다’는 미술의 정의가 변화하고 그 경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2부 ‘예술가와 도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급부상한 도시 환경이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한다.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한 작품들로 오윤의 ‘마케팅I:지옥도’나 김구림의 ‘1/24초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됐다. 3부 ‘새로운 연대’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했고 한국·필리핀·태국·타이완·인도네시아 등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등을 이야기한다. 전시는 5월6일까지 열린 후 6월부터는 싱가포르국립미술관으로 순회전을 이어간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