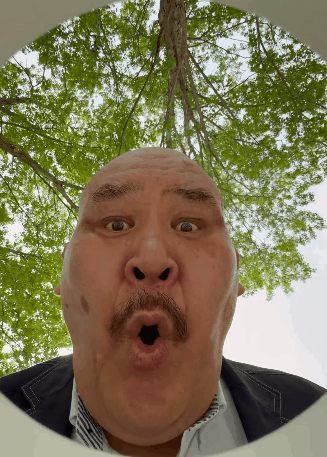이순화
쓸쓸하다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 춤춰요
그대를 멀리 두고 나는 여기서
스치는 바람과 춤춰요
떠도는 공기와 춤춰요
두 팔과 두 다리와 쓸쓸한 저녁과 춤춰요
찻잔과 연필과 식탁 위 시든
꽃잎과 나는 벌써 이렇게
취해 있는 걸요
어둠이 발등을 두 무릎을 적시기 전에
또 하루가 저물어 서쪽
별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기 전에
모든 추락하는 것에 손을 얹어
춤춰요
그대를 멀리 두고 나는 여기서
내 긴 머리칼과 하얀 두 손과
붉게 타오르는 저녁놀 굽이쳐 흐르는
산맥과
아득하게 떨어져 내리는 우주의
가난한 영혼과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쓸쓸하다는 말 대신에
우리 춤춰요
이렇게 멀리서도 함께 춤출 수 있었군요. 보이지 않아도, 손잡지 않아도, 그대와 나 사이에 산맥과 강물과 바람을 두고도 춤출 수 있었군요. 공연히 무릎깍지 끼고 노을 너머만 바라보았군요. 추락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필생의 춤사위이기 때문이군요. 사랑한다는 한 마디 말보다, 쓸쓸하다는 열 마디 독백보다 춤으로 알겠군요. 춤과 멈춤 사이가 인생이로군요. 두 팔을 저으며 발을 구르며 눈썹을 휘날리며 춤춰요, 우리.<시인 반칠환>
/여론독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