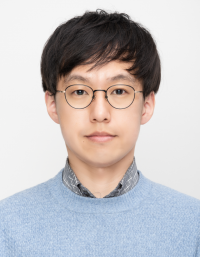“음원 차트 200위 내 곡의 매출 점유율이 30%를 넘습니다. 나머지 수천만 곡이 70%의 수익을 분배하고요.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더 쏠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입니다.”
지난 12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저작권료 분배의 실태를 토로하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간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가수 영탁으로 불거진 이른바 ‘음원 사재기’ 때문이다. 영탁 소속사는 음원 사재기로 스트리밍 횟수를 부풀렸고, 그 결과 저작권료 수입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에는 전체에서 특정 음원의 재생 수 비중을 계산해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비례배분제 방식이 있다. 2000년대에 도입된 이 방식은 급팽창한 시장에서 음원 사재기, 팬덤이 특정 곡의 스트리밍 횟수를 늘리는 이른바 ‘스밍 총공(스트리밍 총공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팬덤의 총공이 차트에 특정 가수의 곡을 ‘줄 세우기’ 하고, 음원 사재기로 특정 곡이 차트 상위에 오르면 저작권료 분배 몫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 소비자들이 차트 밖의 뮤지션 곡을 들어도 이들 곡에 돌아갈 저작권료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음악인들은 활동 의욕이 꺾이고, 그만큼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해 보인다.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트리밍 횟수 대신 음원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새로운 정산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음악인들이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공정한 수익 배분이야말로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성을 세우고 음악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