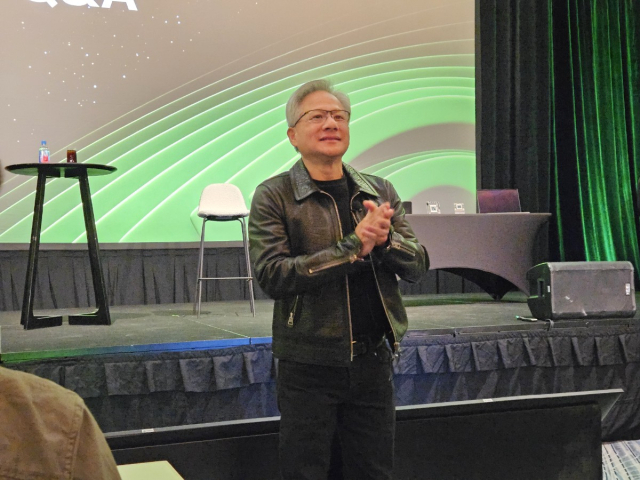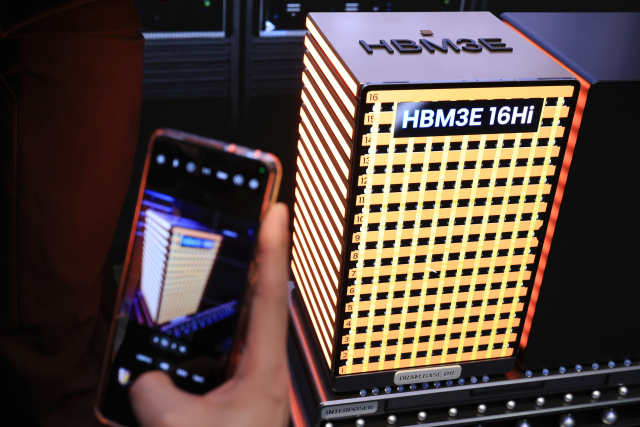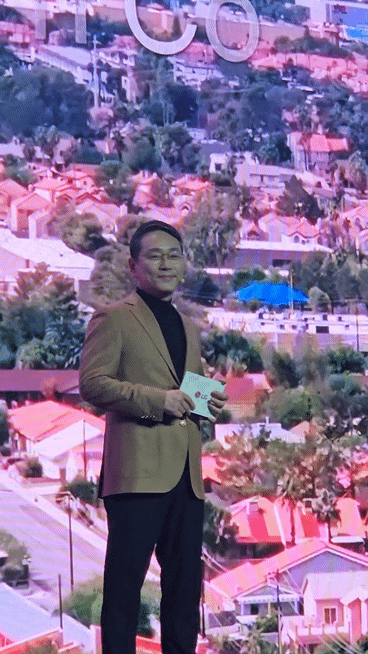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계가 아프리카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배터리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니켈·리튬이 다수 매장된 남미·호주·인도네시아를 넘어 원자재 조달처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학사 ‘톈츠머티리얼즈’는 모로코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최대 2억 80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테슬라 등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이 업체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모로코 진출을 택했다.
아프리카 대륙 북단에 위치한 모로코에는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인산의 원재료인 인광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묻혀 있다. 전 세계 인광석 매장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리튬 또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매장돼 있다. 원자재 정보 분석 업체인 S&P글로벌커머디티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공급량 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에서 2027년 기준 1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에는 스텔란티스ㅍ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공장들이 여럿 진출해 있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설립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 ‘궈쉬안’은 총 63억 달러를 투입해 연 생산능력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놓고 현지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K배터리도 아프리카 진출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손잡고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미국·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만큼 IRA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잇따라 아프리카에 깃발을 꽂는 것은 광물 조달처 다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는 IRA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산 소재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CRMA에 따라 자국 내 광물 조달 비중을 크게 낮추고 해외에서 소재를 공급받기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리튬의 주요 조달처인 남미에서는 국유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조달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아프리카 역시 개발도상국이라 투자 리스크가 크지만 미국과 EU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