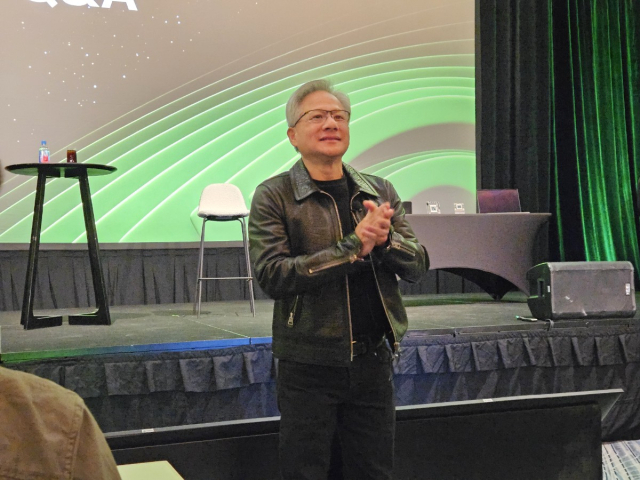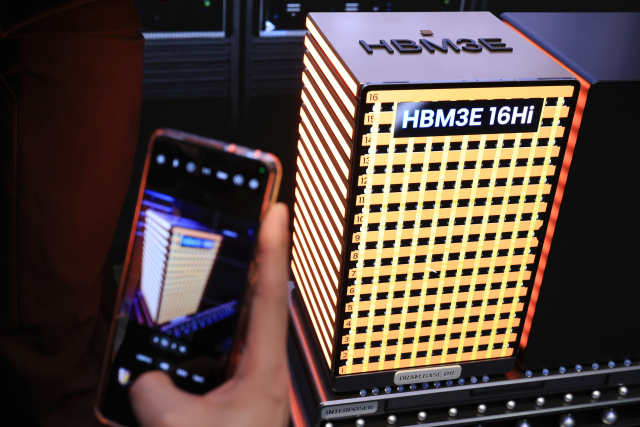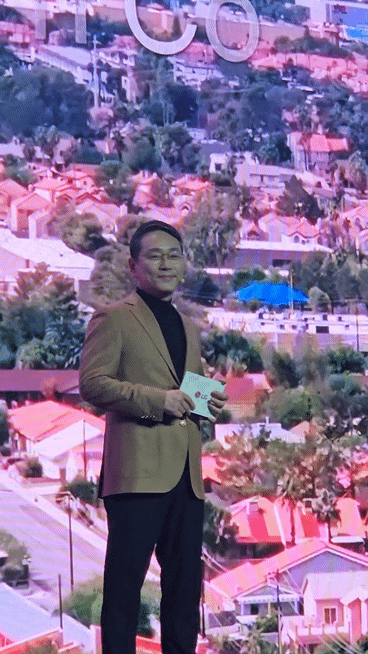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 증원·경력 법관 요건 세분화를 제시했다. 또 예산 자율 편성·법률안 제출권도 사법부에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부여돼야 정치권 영향에서 독립하면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무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관 정원 가운데 7%에 달하는 220여명이 육아휴직과 연수로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3214명인법관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37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 차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도 중요하다”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판사 임용 요건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이다. 2015년과 2029년에는 각각 7년,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원은 임용 요건 강화가 판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호소해 왔으나 ‘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되자 배석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게 뽑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전혀 권한(예산 편성·법률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권에 부탁하게 된다”며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자기들의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국회에 있다 보니, 정치권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재판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건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며 다소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사법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 담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