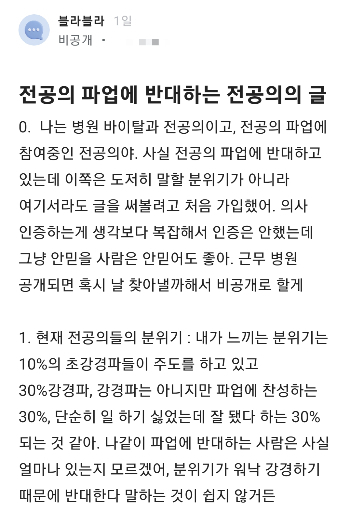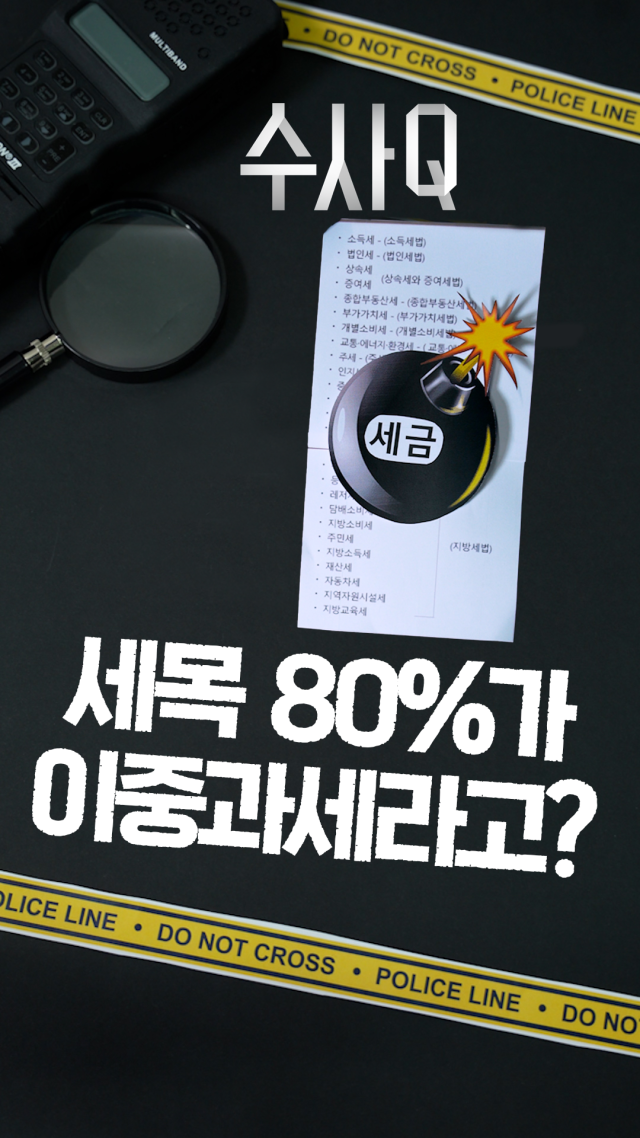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바이탈과 전공의’라고 밝힌 누리꾼이 쓴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탈과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과로, 흉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을 말한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바이탈 전공의라고 소개하며 전공의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비난받거나 프락치로 의심받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실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라도 글을 써보려고 처음 가입했다"며 "의사 인증하는 게 복잡해서 인증은 안 했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좋다. 근무 병원 공개되면 혹시 날 찾아낼까 걱정돼 비공개로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전공의 파업 분위기에 대해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30%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며 "나처럼 파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반대를 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라며 “2020년에는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파업에 적극 찬성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전공의는 국내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들어 파업에 반대했다.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현재 개원의와 교수 간 소득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힘든 일을 하는 교수직은 더 이상 젊은 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기존에 있던 교수들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러한 격차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비급여 의료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가 성행하면서 일선 병의원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행동은 개인적으로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