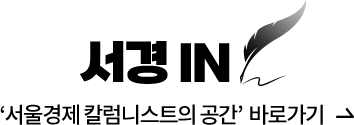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지면서, 자연의 울음소리도 가득하다. 한 낮, 뻐꾸기 울음소리는 문설주에 기댄 눈먼 처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윽고 한 밤이 되면, 개구리 소리는 별만큼이나 밤하늘을 가득 채운다. 이처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수많은 시간동안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고와 의식을 갖기 때문에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어쩌면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인간도 자연의 한 단면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물도 인간의 것이라면 그것 또한 인간적이고 자연을 닮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도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지식이나 판단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빠른 연산능력 덕분이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의 충격에도 창작활동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안위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거나 창작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공지능의 창작은 의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가장 근접한 결과물이 생성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어떤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선택한다. 인공지능도 그렇다. 인공지능이 특정한 결과물을 생성할 때, 인간처럼 부여된 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확률적으로, 또는 인간의 경험과 습성에 따라 언어의 선택이 달라진다. AI 모델이 갖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표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말 인간을 모방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지는 생각과 사고는 무엇일까? 인간의 발명품인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뇌과학자들도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한 그 원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타인의 것을 모방하면서 학습한다. 모방의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이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기계의 특이점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특이점은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발현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학습할 대상은 무한한다. 그렇지만, 기계에게는 그 또한 한정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빅뱅 이후의 모든 정보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가능하다. 기계적 이라고 하지만,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는 다른 매커니즘이 활용된다.
인간의 학습은 저작물을 향유하는 행위이다. 향유란 저작물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인간이 감각을 통해 즐기거나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에서 논란이 되는 법률 중 하나인 저작권법은 인간의 향유를 전제로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나 공정이용(fair use)이 가능해야 한다. 기계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포함한 저작물은 인간의 문화적 향유를 전제한다. 즉, 창작과정에서 의도했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것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활동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이 아닌 기계적으로 특징점(features)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다르게 취급된다. 기계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을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기계적인 특성은 반복적이지만 시간적으로 인간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데이터에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는 데이터에서 인간이 의도한 문화적인 사상과 감정을 향유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과 그에 따라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면, AI는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AI가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면 무엇이 될까? 또 다른 인류가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공지능, 더 정확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최초의 객체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비에 비유하고, 그 비가 AI라는 냇가를 가득 채울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는 알 수 없다. 다음처럼 단순하지 않을까?
“냇가는 물로 가득 찼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모습이 보인다.”
어쩌면, 인공지능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다만,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인공지능은 윤리적 기계가 돼야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은 인간과는 달라야하는 숙명을 갖는다. 어쩌면 비상정지 버튼까지도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