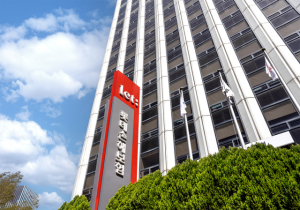국내 보험회사들이 11월에도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앞다퉈 발행한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없는 돈을 고금리에 수천억 원 조달하는 게 과연 맞냐”는 불만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다음 달 4일 4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금리는 최고 4.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일 2500억 원 모집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797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아 4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000400)도 다음 달 1일 1500억 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금리는 최대 6.2%를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발행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3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다음 달 5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최대 6000억 원까지 발행한다.
보험 업계는 올 들어 자본성 증권 발행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9월에는 한화생명(088350)(신종자본증권 6000억 원), ABL생명(후순위채 2230억 원), 흥국화재(000540)(후순위채 2000억 원)가 자금을 조달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보험 업계가 발행한 자본성 증권 규모는 총 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도입된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킥스 비율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눠 100을 곱해 %로 나타내는 자본 건전성 지표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게 증가해 가용 자본이 줄어들고 킥스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 당국의 킥스 비율 권고치는 150%지만 언제든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어 이 비율을 200% 이상으로 맞춰 놓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험 업계는 이를 맞추기 위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줄줄이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2.6%, 손해보험사는 223.9%로 양호한 편이다.
보험사의 자본 확충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회사의 실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킥스 비율을 지키기 위해 조달한 돈은 그야말로 쥐고 있어야 하는 돈”이라며 “규제의 선을 지키기 위해 비싼 이자만 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성 증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높고 작은 보험사일수록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떨어져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면 현재 발행한 자본성 증권의 금리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회계상 자본 확충일 뿐 사실 쓰지도 못할 돈을 고금리에 빚 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비율 도입의 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