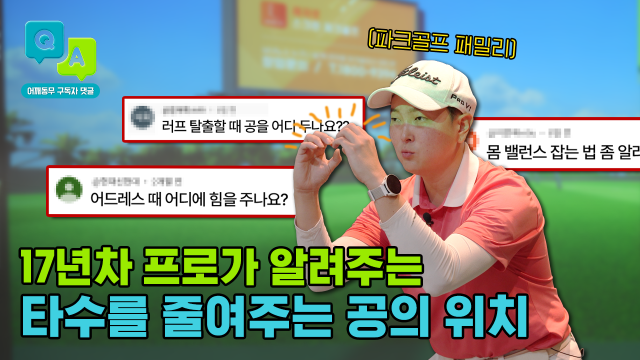지한솔(28·동부건설)이 받은 우승 축하 인사 중에는 “축하한다”만큼 “감동이다”가 많았다. 올 시즌 초 갑자기 찾아온 갑상샘항진증 탓에 서있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지한솔은 악착같이 투어 생활을 이어갔고 끝내 우승까지 해냈다.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의 88CC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다. 2라운드에 꿰찬 단독 선두 자리를 마지막 4라운드까지 놓치지 않고 14언더파로 2타 차 우승을 완성했다. 빠른 스피드와 까다로운 경사가 겹쳐 올 시즌 가장 어려운 그린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지한솔은 거기서 나흘간 3퍼트가 1개뿐일 만큼 ‘짠물’ 골프를 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로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억척같이 시즌을 끌고 온 그는 최종일 노 보기로 기어이 정상을 지켜냈다.
4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제신문을 찾은 지한솔은 “그 어느 우승보다 동료들에 대한 감사가 큰 대회였다. 투어를 뛰면서 저는 그저 제 할 일만 하던 선수인데 동료들이 그동안 위로와 격려를 정말 많이 해줬다”며 “지난해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정말 큰 힘이 됐다. 힘든 일들을 통해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올봄 시즌 첫 대회부터였다. “전신 떨림 증상이 너무 심한 나머지 어드레스 들어간 뒤 언제 휘두를지 도무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겨우 때린 드라이버 샷은 200야드도 못 가고 고꾸라졌다. 국가대표 출신의 투어 통산 3승 강자인 지한솔에게는 자존심의 문제. 투어에 병가를 내고 좀 쉬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지한솔은 그러지 않았다. 3일 끝난 제주 대회까지 올 시즌 29개 대회를 뛰었다. 1개 대회만 쉬었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일단 해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나가도 컷 탈락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쉬어도 대회는 나가면서 쉬자는 마음이요. 감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앞서 같은 병을 앓았던 후배 선수 방신실 측의 도움도 결정적이었다. 병가 제출을 고민하던 중 지한솔의 어머니가 그쪽에 조언을 구했고 방신실의 부모님은 딸의 일처럼 지한솔을 도왔다. 지한솔은 “세세한 부분까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도움을 받으니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의지가 더 굳어졌다”고 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했다. 웨이트트레이닝은 줄이고 샷 연습도 감이 온다 싶을 때까지만 하고는 클럽을 내려놓았다. 최대한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많이 먹고 잘 쉬어야 했다. 연습량이 많기로 유명한 지한솔로서는 조바심이 날 낯선 루틴이었다. 그런데 꾸준한 경기 출전으로 감은 유지하면서 푹 쉬니 조금씩 성적이 나기 시작했다. 9월 2주 연속 준우승에도 아쉬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컸고 그렇게 끌어올린 감으로 2년 2개월 만의 통산 4승에도 다다랐다.
4승을 매듭짓는 순간에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지한솔은 믿는다. 딸이 신예 시절에 골프백도 많이 멨던 아버지는 흰나비의 모습으로 딸의 우승 퍼트를 함께했다. “막판에 예보에도 없던 비가 왔어요.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기쁨의 눈물인가 보다’하면서 달게 맞았죠. 근데 그린에 올라가 퍼트를 하려는데 시선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한테 온 거였어요.”
투어 프로 출신인 오빠(지수진 씨)의 지도 아래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지한솔이지만 우승과 우승 사이에 시련이 유독 많았다.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싹 다 입스(샷 하기 전 불안 증세)가 와 고생했었고 아버지의 병을 알고 나서 심적인 방황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지한솔은 한 발짝씩 나아갔다. 그렇게 쌓은 세월로 데뷔 10년을 채웠다.
등산을 즐기는 그에게 ‘지한솔의 골프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산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급경사의 비탈과 완만한 길이 어지럽게 반복되는 그런 산이요. 그래도 어쨌든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10년이요? 또 산이어도 괜찮아요. 다만 손만 뻗으면 정상에 닿을 수 있을 듯한, 동네 뒷산이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