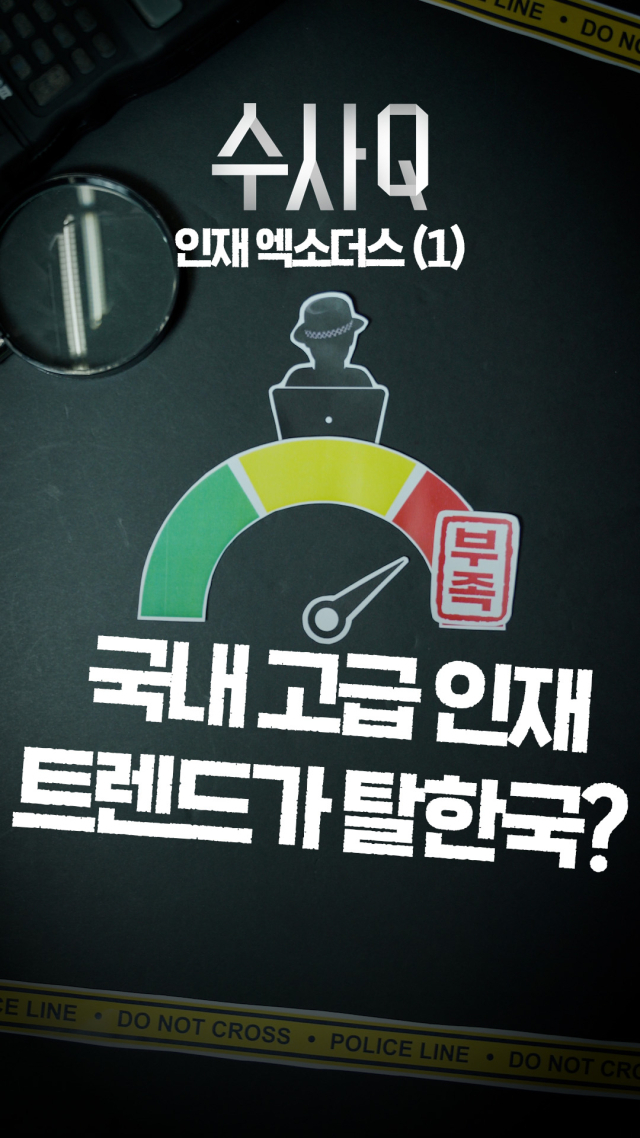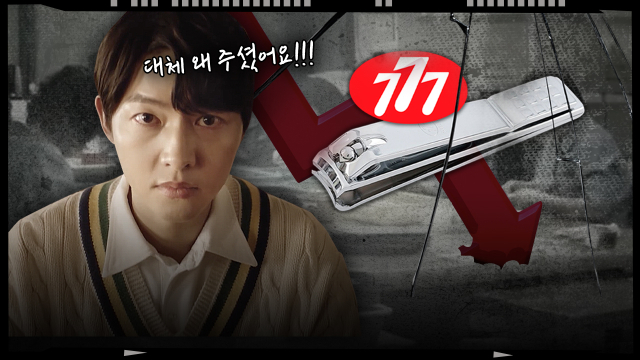By Dan Primack
일반 미국인들이 유능한 젊은 IT기업에 투자해 금융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규제나 현금 부족 때문이 아니다. 투자할 기업 자체가 없는 탓이다. 신생기업들이 오랫동안 비상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어 기껏 소수 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득 불균형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등장했다. 이 논쟁은 특히 실리콘밸리(San Francisco Bay Area)에서 뜨겁다. 이곳에서는 고임금 IT 일자리 때문에 아파트 월세와 집값이 치솟고 있다.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다. 아마존 Amazon이 창업 4년 만에 기업 공개를 했던 1997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유치 자금은 4,800만 달러, 주가는 주당 16달러에 불과했다. 최초 시가총액은 3억 8,200만 달러였다. 현재 아마존의 시총은 1,590억 달러로, 주당 3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그간 몇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다). 7년 역사의 구글이 2005년 기업 공개를 했을 땐 어땠을까. 당시 주가는 85달러였고 시총은 23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현재는? 주당 580달러에 거래되고 (올 초 주식 분할이 한 차례 있었다) 시총은 3,900억 달러다.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초기에 몇 백 달러만 초기에 투자했어도 지금 수만 달러는 됐을 것이다.
아마존과 구글이 요즘 설립됐다면, 두 기업 모두 기업공개를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들 기업이 초창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금의 성공 순서도는 분명했다. 부자 친구한테 약간의 종자돈을 모으고, 벤처캐피털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를 했다(엔론 Enron 사태 이후 2002년 법규가 강화되고 기업 공개가 더욱 어려워졌음에도 말이다).
오늘날 뜨고 있는 신생기업은 대규모 자본이 존재하는 용감한 신세계에 살고 있다. 헤지 펀드, 은행, 뮤추얼 펀드, 그리고 국부펀드가 기업공개 전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Fidelity Investments는 설립한 지 5년 된 자동차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 Uber를 위해 14억 달러의 ‘벤처 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투자 당시 기업가치는 180억 달러 이상이었다(참고로 렌터카업체 허츠 Hertz의 기업가치는 130억 달러 미만이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우버의 가치는 35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버는 같은 기간 동안 도대체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나 아이다호 주 보이시 Boise의 높은 집세를 내는 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헤지 펀드와 뮤추얼 펀드에게 기업공개 전 투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공개 시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 주식공모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무언의 약속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자들에게 기업 공개는 경영권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가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우선, 대부분의 기업 문화는 설립 몇 년 안에 실질적으로 형성된다. 둘째, 창업 최고경영자로서 복수의결권주(Dual Class Stock)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들은 기업공개 이후에도 상당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한때 ‘경영권 고수’의 지지자로 가장 유명했던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왔다. 그는 작년 가을 한 회의에서 “회상해 보면 기업 공개에 대해 너무 두려워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로 남아 있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기업공개를 하는 최고경영자는 분명 없을 것이다. 거대한 전략적 실수라고 믿는 기업공개를 열정적으로 관장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경영자도 기업공개가 단순한 자금모집 이벤트나 창립 멤버의 지분을 현금화 하는 방법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공개는 사회주의적 무임승차가 아니라 공익(Civic Good)이 될 수 있다. 주주와의 공생 관계를 통해 주변 시민사회와 국가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다. 기업 공개에 나서라. 국민들을 위해서.
겟텀시트닷컴에서 댄 프리맥의 뉴스 레터를 구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