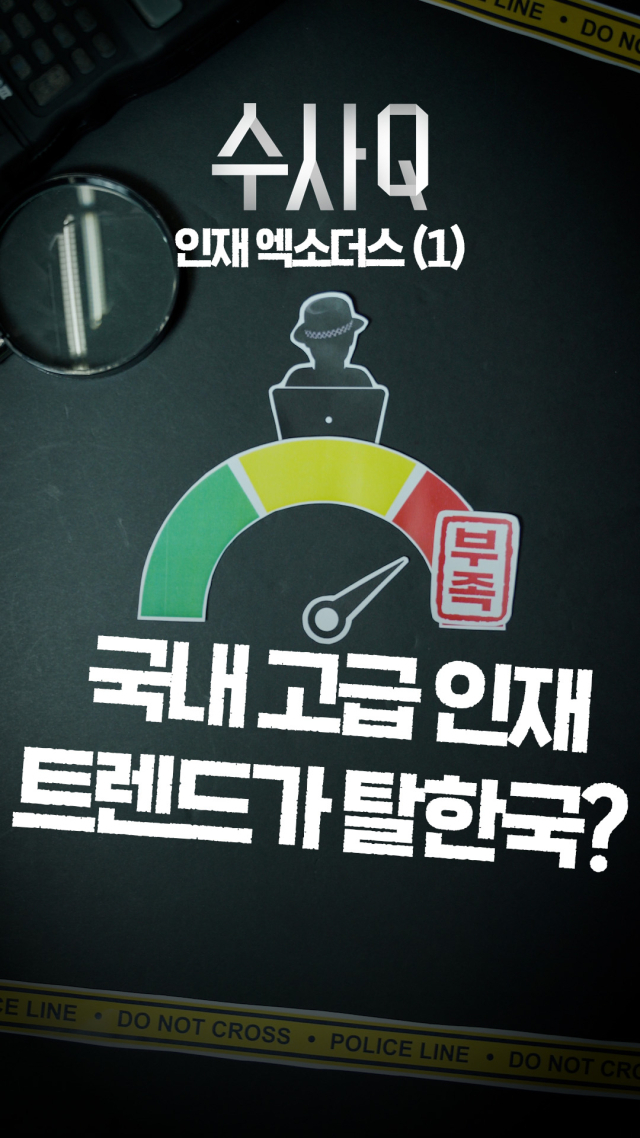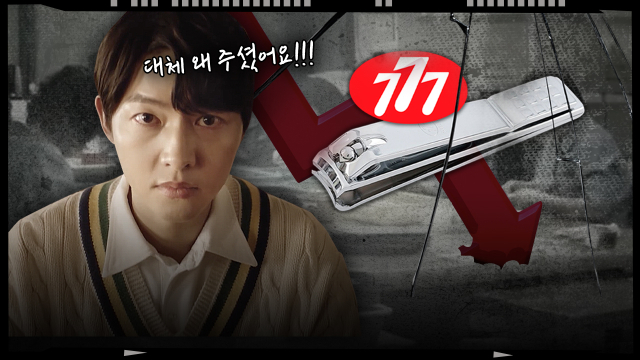지금부터 4년 전 한국 외환 당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에는 연초부터 경기가 고꾸라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ㆍ달러 환율마저 급락,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외환 당국은 처음에는 “환율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이 지나치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다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환율 방어용 실탄을 투입, 달러를 사들였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급기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역외선물환시장(NDF)까지 넘다들었다.
실탄이 거의 소진되자 적은 금액으로도 대량의 달러 매입 효과를 거두는 차익결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역외시장 개입 과정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는 물론 지금까지 두고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한 당국자는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겠다”며 기세등등했으나 환율 방어전쟁은 국고만 축낸 채 실패로 끝났다.
환율 방어 총력전에 나섰던 2003년 말 원ㆍ달러 환율은 1,140원대였다. 달러당 900원선이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돈과 정력이 투입된 당시 환율 방어전은 허망까지 하다. 당시 달러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 이미 2003년 9월 두바이에서 회담을 가진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유연한 환율제도’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발표, 약 달러를 사실상 용인했다.
그래서 두바이회담은 1985년 달러 약세를 용인한 ‘플라자 합의’의 후속판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중반 시작된 달러 약세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까지 10년간 계속됐던 과거의 사례와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감하면 달러 약세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실효 환율을 감안한 달러가치는 아직도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환율의 시계추를 되돌려보는 것은 달러 약세 기조로 환율 방어에 필요 이상의 소모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다. 달러당 800원대 재진입 가능성이 높은 때라 더욱 그렇다. 900원을 저지선으로 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달러 약세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나랏돈과 정력을 쏟아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