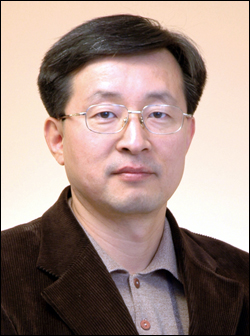"위성탑재용 광학거울 고정밀 제작기술 개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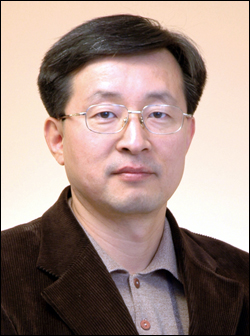 | | 이윤우 연구단장 |
|
 | | 우주광학연구단이 위성탑재용 망원경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는 지상 성능 테스트용 장비의 광학거울을 최종 테스트하고 있다. |
|
"고정밀 렌즈나 거울이 위성 탑재 망원경과 천체망원경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연구단 이윤우(47) 단장은 위성에 탑재되는 망원경의 해상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거울'이라고 강조한다. 이 단장의 연구팀은 유리나 세라믹 재료를 15나노미터의 정밀도로 표면을 깎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렌즈나 거울의 표면을 매끈하게 깎아 내는 것이 대단한 기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직경 1미터가 넘는 크기에 무게가 400kg에 달하는 재료를 정밀하게 깎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주광학연구단은 지난 9월에 비구면 광학거울을 자동으로 깎아 주는 자동가공시스템을 개발해, 대구경 광학거울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자동가공 시스템으로도 15나노미터 정밀도에 직경1m 크기의 광학거울을 제작하는 데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제작된 광학거울 표면에는 특수 알루미늄 코팅이 입혀진다.
아리랑 1,2호 위성의 광학 카메라를 모두 외국에서 턴키방식으로 수입해 장착해야 했던 주된 이유도 고정밀의 광학거울을 국내에서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위성에 탑재되는 망원경은 군사기술로 분류돼 도입이 불가능하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울의 구경이 커져야 합니다"고 말한다.
통상 위성에 탑재되는 망원경은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렌즈가 아닌 광학거울을 이용하는 추세이며, 1m급의 경우 뒷면을 벌집형태로 깎아내 400kg의 무게를 130kg정도로 줄여야 한다.
또 완전한 구면의 거울은 영상이 닿는 부분의 초점이 달라져 영상이 왜곡되지만, 비구면의 경우 중심부와 외곽의 초점이 한곳으로 집중되도록 제작한다.
1m급의 해상도를 가진 아리랑 2호의 경우 약 0.7m급 광학거울을 사용했지만, 2011년 발사예정인 아리랑 3호의 경우 0.9m급 광학거울을 사용해 70cm급 해상도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 탑재 망원경은 오목거울 형태의 주 거울에 잡힌 영상을 전면에 부착된 소형의 보조거울로 반사한 뒤, 주 거울 중심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주 거울 뒤쪽의 영상 반도체에 영상을 집중시키는 형태다.
이 단장은 "항우연이 위성 탑재용 광학망원경의 성능을 시험하는 측정장치를 개발중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0.9m급 광학거울을 제작해 다음달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내년 1월 말레이시아가 발사 예정인 위성에 탑재되는 0.3m급 광학거울을 국내 탑재체 제작사인 (주)세트렉아이를 통해 이미 공급했다.
현재 2m급 광학거울을 제작 할 수 있는 대구경 광학거울 가공실을 12월 완공하고, 내년 봄부터 제작에 도전한다. "2m급의 경우 직경은 1m급의 2배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4배가 넓어지기 때문에 고정밀을 구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제작에 성공할 경우 대형 천체망원경을 국산화하고 고해상도 위성탑재 망원경을 개발하는 데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