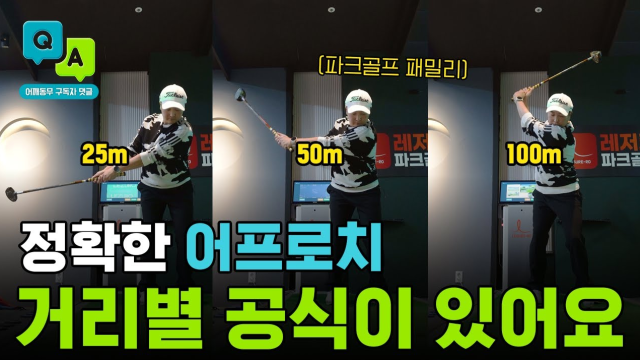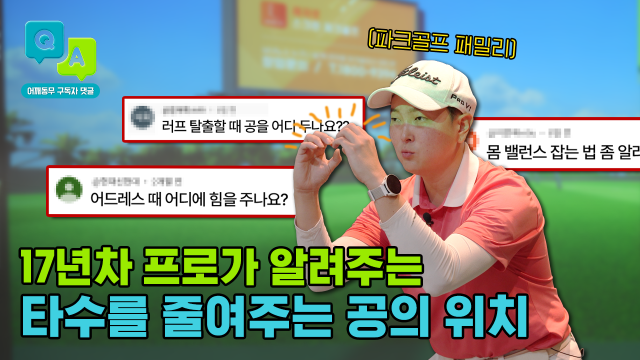금융공기업 연봉은 전 정권 초기까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소폭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비판이 가라앉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 9곳 중 8곳이 최근 2년간 7~12% 인상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지난해에만도 6.17%나 뛰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2.22%의 3배나 된다.
경영을 잘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순이익이 50% 이상 급감했고 코스콤과 예탁원 역시 각각 35%, 24% 줄었다. 정책금융공사는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회사는 멍들어가는데 임직원은 배를 두드리는 꼴이다.
금융공기업이 방만경영을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 노조와 권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와 상관없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몫부터 챙기자는 인식도 한몫 했을 것이다. 임직원들 역시 경쟁자가 없으니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금융공기업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부어 만든 곳이다. 실적개선 없이 직원 봉급이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새는 곳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CEO의 임기를 보장해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