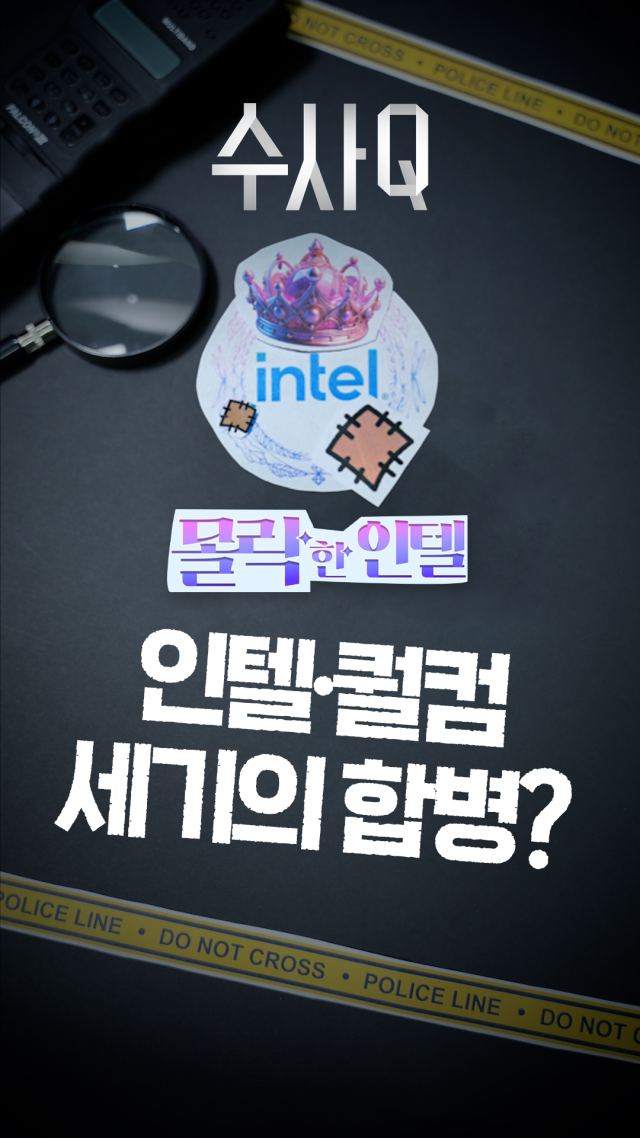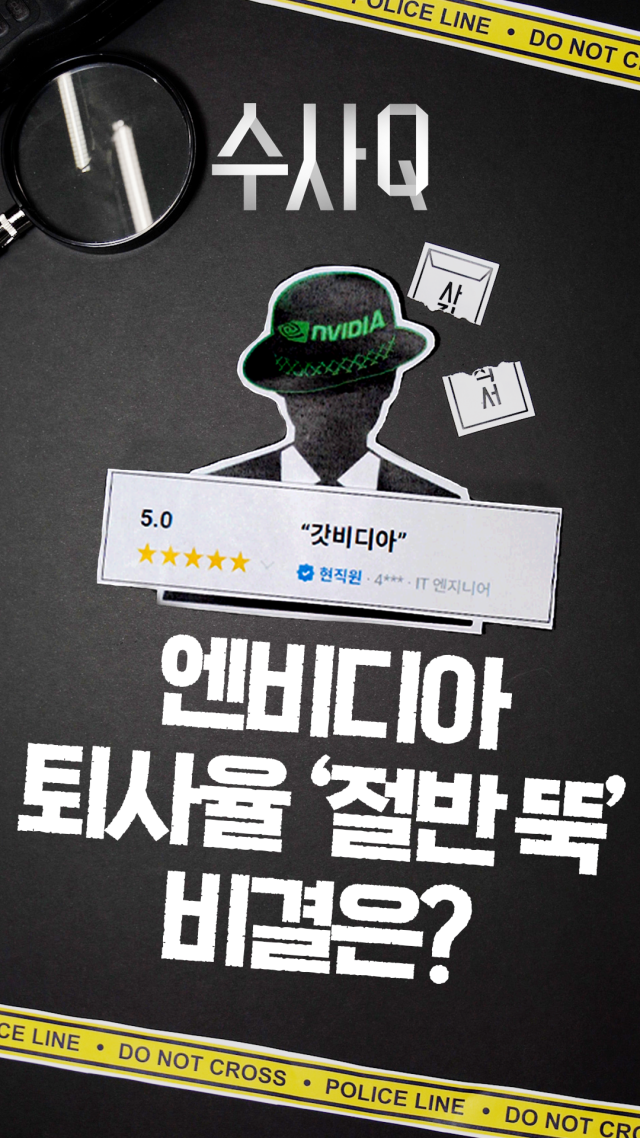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발묶인 외환정책이 원화 강세에 한몫"
입력2006.11.10 17:28:40
수정
2006.11.10 17:28:40
■ 환율 930원선 붕괴 눈앞<br>전문가 "외평기금 손실 논란에 시장방어 기능 위축" 분석<br>"대일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커져 적정수준 개입을" 지적도
원ㆍ달러 환율 930원선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발 묶인 외환정책이 원화 강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손실 논란으로 인한 외환 당국의 위축, 통화정책 혼란이 환율 하락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강지영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은 ‘월별 환율예측 보고서’에서 “지난달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외평기금 국감을 전후로 원ㆍ달러 환율 하락이 가속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원ㆍ엔 환율도 100엔당 700원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외환 당국의 운신폭이 좁아지고 개입이 힘들어지면서 환율 공격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평기금 논란이 마무리된 뒤에도 일정 기간 원ㆍ달러 환율 움직임은 역외세력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원화 강세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리인상 혼란과 원화강세’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정책의 최우선이 되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금리인하기보다 인상기에 외환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화가 엔화에 대해 강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물론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외환 당국의 적정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 들어 원화 환율은 20% 넘게 떨어진 반면 엔화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0%나 오른 상황에서 외환 당국이 ‘눈치보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외환시장에 인위적이고 무리하게 개입, 손실을 입히는 것은 잘못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개입은 외환 당국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매번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무리라면 외환시장 규모를 더 키워 가격 변동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하루 외환 거래량이 80억~90억달러로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났지만 역외세력의 작은 공격이나 몇몇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아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