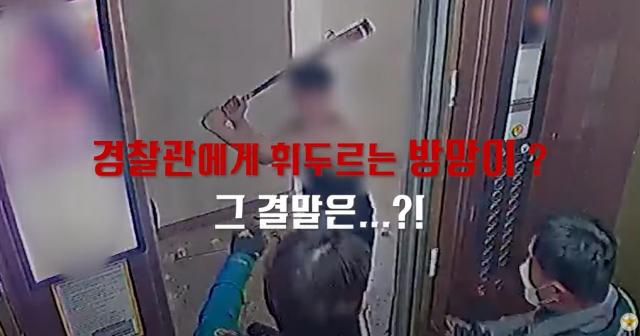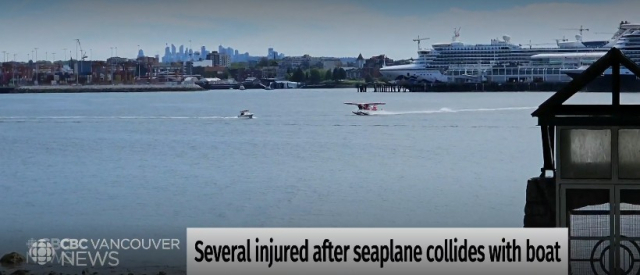지난주 미국 경제는 모순되는 두 가지 신호를 보냈다. 뉴욕증시의 다우주가가 1만3,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는가 하면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해 지난 2003년 감세정책 실시 이후 4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식시장은 원래 유동적이다.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시장 자체는 미래를 내다보지만 GDP 통계보다는 덜 정확하다.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는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투자 위축이 GDP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물론 주택시장의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가 아닌 것은 다행이다. 실업률은 4.4%로 낮고 안정된 노동시장은 기술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임금 인상은 비싼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순익은 기대 이상이었다. 수입 증가는 경제 성장의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해외의 경기 전망을 감안하면 수출이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1ㆍ4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4%나 상승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2.2%가 올랐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목표치를 초과한 것이다. 노동통계청은 올해 CPI가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오히려 성장 지향의 ‘그로스플레이션(growthflation)’ 상황에 더 가깝다.
FRB는 저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이라 전망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 교훈이 말해주듯 인플레이션은 저성장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현상이다. 즉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데 있을 뿐이다. 때문에 지금 의회가 주장하는 증세정책과 보호주의는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 2003년 시작된 감세정책이 오는 2010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증세론은 경제에 대한 불안만 키울 수 있다. 감세정책이 유지되든가, 혹은 성장 지향적인 세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앞을 내다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