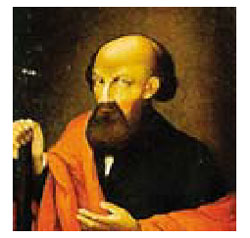홈
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3월26일] 니키타 데미도프
입력2007.03.25 17:32:38
수정
2007.03.25 17:32:38
표트르와 데미도프. 러시아의 서구화에 힘을 합친 차르(황제)와 대장장이다.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표트르 대제의 산업화에 대한 의지 때문이다.
개혁군주 표트르의 등극 초기 현안은 무기를 만들 자원의 부족. 양질의 철과 구리를 수출하는 스웨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였다. 국내 광산과 제철업을 개발하기로 작정한 차르는 제련 솜씨와 경영수완을 함께 갖춘 기술자를 찾았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니키타 데미도프(Nikita Demidov)는 러시아의 신흥 제련업자. 1656년 3월26일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쇠와 풀무 속에서 자라며 익힌 기술도 최고였다.
데미도프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외국제에 비해 손색 없는 총기를 훨씬 싼 값에 제작해냈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으로 무기류를 공급하는 대신 광산개발 독점권을 딴 데미도프는 얼마 안 지나 러시아 최고 갑부로 떠올랐다. 스웨덴과 21년에 걸친 북방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 공로로 귀족 작위도 얻었다. 데미도프가 공급하는 무기와 철제품으로 무장한 러시아는 열강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철공업자에서 명문 가문으로 부상한 데미도프가는 러시아에 약과 병을 동시에 안겼다. 후손들도 광산을 개발해 ‘우랄의 군주’로 불릴 만큼 부를 쌓고 시베리아 개척을 주도했지만 문제는 탈세. 거대한 은 광산을 발견한 데미도프 가문이 세금을 피해 은을 몰래 생산하다가 적발된 후 러시아에서 기업인들은 신뢰를 잃었다. 황족과 전통귀족들이 기업을 불신하고 천시하는 풍조 속에서 표트르 대제의 업적은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다 할 산업 하나 없이 농민을 쥐어짜던 러시아의 전근대적 봉건구조는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불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