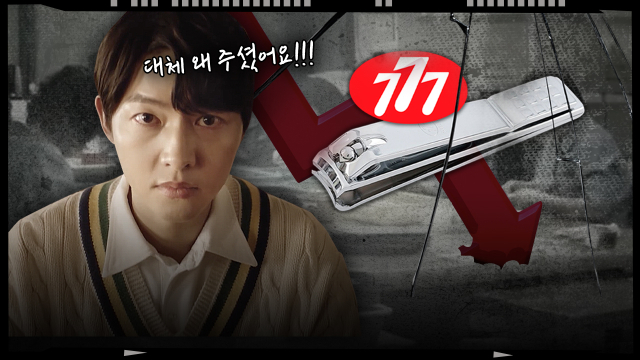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
|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한시(漢詩) 가운데 두보(杜甫)의 ‘등고(登高)’라는 시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가을이 오면 만추의 적막함이나 무상함이라든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의미로 가끔 정치인들 퇴임 무렵에 인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 시의 결구 ‘요도신정탁주배(료倒新停濁酒杯)’에서 ‘정배(停杯)‘를 그동안 ‘새로 술을 끊는다’로 해석했던 것을, 국내 원로 한학자 손종섭 선생이 그의 책 ‘이두시 신평(李杜詩 新評)’에서 ‘술잔을 다시 든다’의 오역(誤譯)임을 지적한 일이 있다.
정배(停杯)란 술잔에 기쁨도 슬픔도, 노여움도 무상함도 이런 모든 인생사를 담아 잠깐이지만 가만히 술잔을 응시한 후 그걸 마셔버림으로써 마음에 담았던 것을 모두 다 풀어버리는 품격 있는 음주법(飮酒法) 중 하나이다. 더불어 아무리 많은 술자리가 있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주법이 있다면 다음 5단계 중 한두 개만 제대로 지켜도 될듯하다.
맨 처음 술잔을 높이 들어 술을 권하는 거배(擧杯), 이어서 앞서 설명한 정배(停杯), 그 다음은 술을 잠시 입에 머금고 향기를 음미하는 함배(銜杯), 이윽고 천천히 술잔을 기울여 목을 조금 뒤로 젖히고 마시는 경배(傾杯), 끝으로 잔을 말끔히 비워내는 건배(乾杯)의 순이다.
건배(乾杯)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주법이지만, ‘건(乾)’에는 ‘마르다’, ‘비우다’라는 뜻 말고도 ‘하늘’,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 ‘하늘(하느님)에 축배를 들자’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거배(擧杯)는 단순히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음주 전 행위가 아니라, 밝은 달을 맞이하는 간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이백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을 보면 제1수에 “거배요명월(擧杯邀明月) 잔을 들어 밝은 달 맞이하고, 대영성삼인(對影成三人) 그림자 마주하니 셋이 친구 되었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시는 이백의 나이 44세인 744년,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양국충 등 황제 측근들과의 마찰 등으로 잠시 지냈던 관직에서 물러나 고독감을 느낄 때 쓴 시이다. 그러나 이백은 벗해주는 이라고는 고작 홀로 있는 자신의 그림자와 밝은 달뿐이었지만, 마시고 있던 술잔을 들어 달을 맞이하며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았으리라. 아마도 그는 술을 통해 이고득락(離苦得樂)하지 않았을까.
요즘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능력보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풀이 죽어 있을지 모르는 취직 못한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모두 모여, 둥그런 술잔에 한잔 가득 맛있는 술을 부어 밝은 달을 맞이하며 마음 속 근심을 씻어내자. 술은 잘 마시면 마음으로 위대했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음(過飮)은 하지 말고, 향음(鄕飮)하면서…. /글·사진= 이화선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 향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