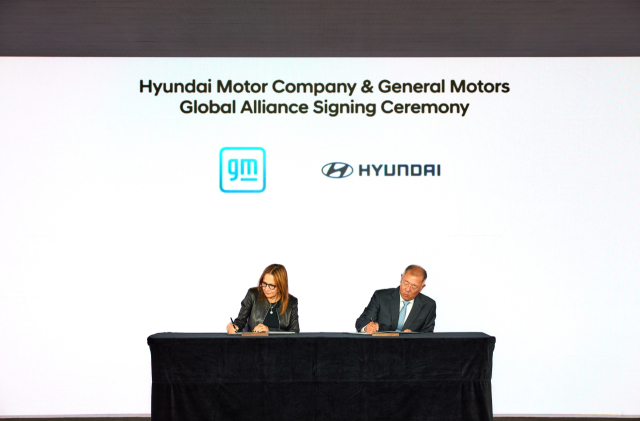재정경제부 책임자와 한국은행 고위 간부가 연이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한 발언이 전해지자, 월가의 한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나가는 길을 막아놓고, 들어오는 것만 저지하겠다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밖에 없질 않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 균형이 잡히고, 이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170원을 위협하자 재경부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시장에 먹혀 들지 않고 있다. 그정도 초강수 카드라면 외환시장이 겁을 먹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상 선거 등 주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정부가 시장 간섭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오래된 경향이다. 90년대 이후 글로벌 단일시장이 형성된 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이감을 형성해주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경제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제 투기꾼들은 이를 노려 역외시장을 우회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세계 외환거래의 중심지인 영국도 92년 의도적으로 파운드 시장에 개입하다가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10억 달러로 공격하자 여지 없이 무너진 바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발언이 국제 시장에서 냉랭한 반응을 자아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와 한은 사이에 정책 갈등에서 빚어진 논란이며, 외환시장 개입이 정책 기조의 모순을 유발한다는 점 때문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전무는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환율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며, 한국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 압력에 선제 대응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돈을 찍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모순의 논리로 전세계 시장을 빠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시장의 흐름을 저지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고 유연하게 거시 정책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6년 전 외환위기 때 입증됐다. 하물며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 비난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스스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목청을 높일 필요까지 있을까.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