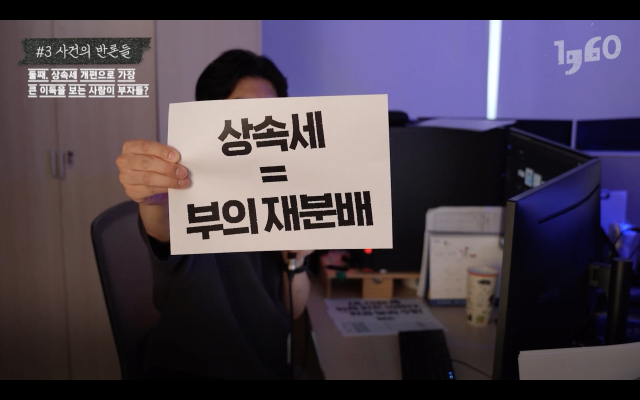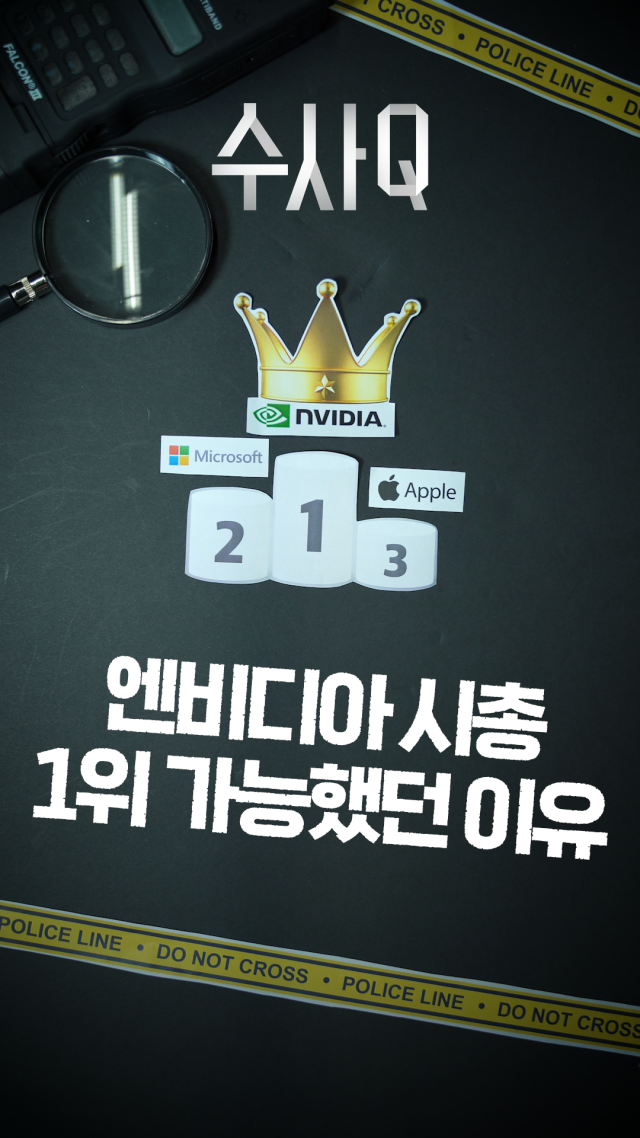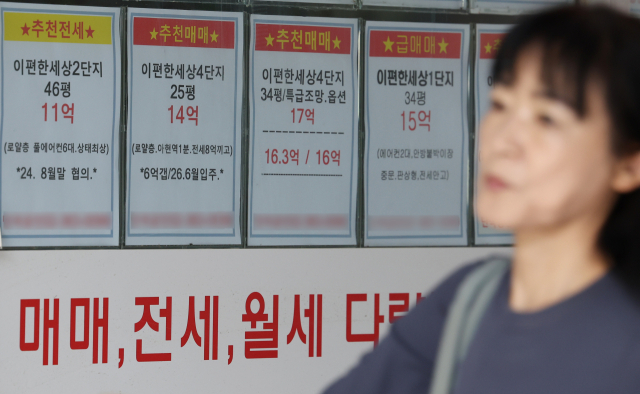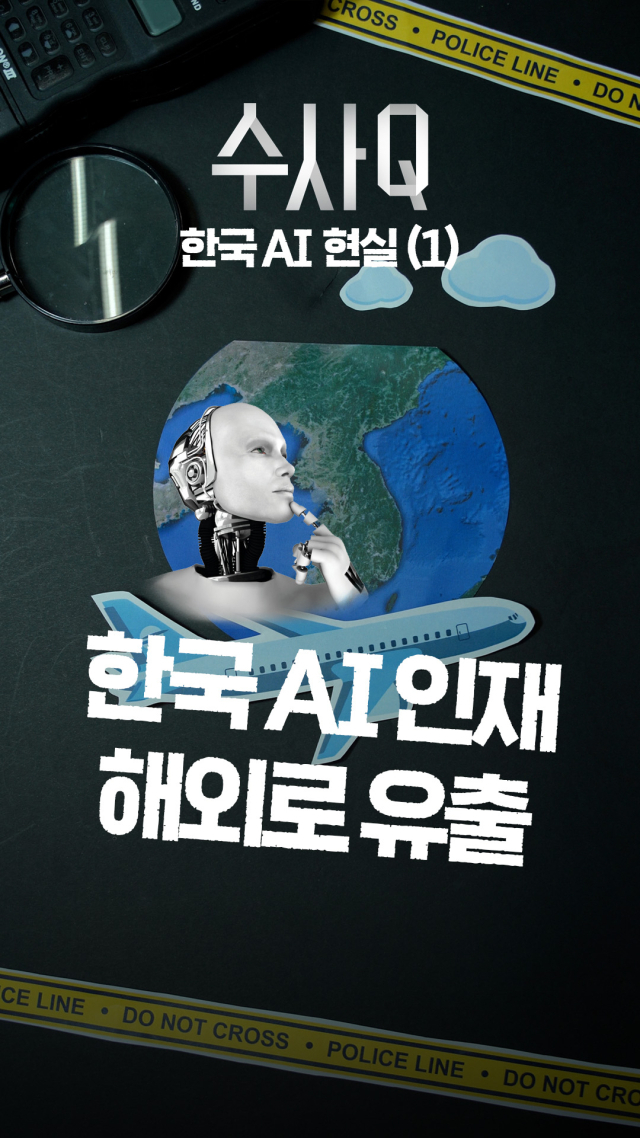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입법안 처리를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문제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60세인 퇴직정년을 62세로 늘리고 그에 따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연금 100%를 받기 위한 사회보장료 납부기간도 현행 40년6개월에서 41년3개월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연금개혁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연금 적립금 20년후면 바닥
프랑스 근로자들이 연금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으로 일을 더 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런 연금법안이 통과됐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고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정년연장은 환영 받을 일이다.
한국은 퇴직연령층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프랑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 비자발적 퇴직이 많지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데 그것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서 연금 대신 기존의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 한국이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이다.
프랑스는 민간 피고용자 대부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일반연금제도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분리돼 있다. 민간 고용 중 자영자의 비율은 프랑스는 9.4%이고 한국은 31.3%이다. 게다가 한국은 일반근로자와 자영자의 국민연금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또 한국의 국민연금은 프랑스에 비해 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돼 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연금수지 악화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낮고 이들의 소득수준도 대개 중하위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달리 자영자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자영자의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연금개혁은 연금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에서 비롯됐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올해 연금으로 인한 적자는 320억유로(446억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8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300만명이고 2030년이면 약 91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프랑스의 인구증가율은 평균 0.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3%에서 0.2%대로 떨어져 감소하는 추세다.
현행 제도 대안책 마련해야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반대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금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은 축적되는 연금기금이 넉넉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래에는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300조원을 돌파했지만 향후 4,200조원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20년이 채 못 되는 시간에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관련 사태를 남의 나라 일로만 볼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