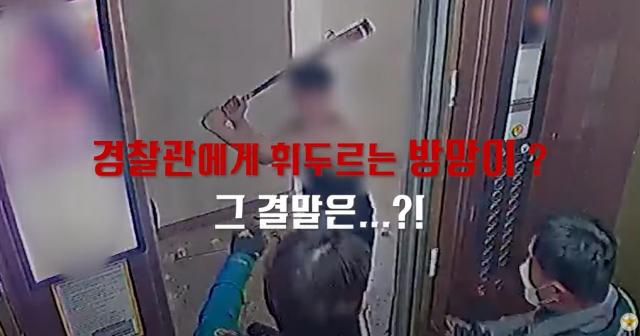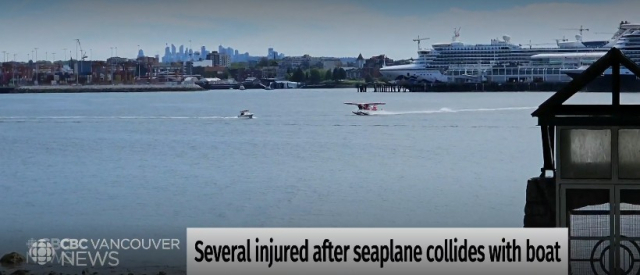아직 우리나라는 흰 눈이 필드를 덮고 있지만 드넓은 미국은 다시 투어대회가 시작돼 골프열기로 들썩하다.골퍼들이라면 사철 푸른 잔디가 있는 그곳을 한번쯤은 부러워했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 특히 평소 안면있는 LA거주 미국인이 늘 그 곳에 있는 골프코스를 자랑했던 터라 최근 출장 때는 『어디 한번?』하며 부러움반, 질투 반의 심정으로 라운드에 나선 일이 있었다.
계절이야 겨울이지만 전형적인 미국 서부의 날시로 기온은 섭씨 15도 정도였다. 바닷가 경기를 뒤로 하고 산 중턱에 자리잡은 롤링 힐스GC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경관이 정말 훌륭했다.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1번홀 대기선에 서고 보니 모두 키가 훌쩍 큰 미국사람들 뿐이었다. 탁 트인 경관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실 조금 주눅이 들었다.
그러나 맨손으로 미국땅에 정착한 우리 선조들처럼 『한 번 해보지 뭐!』하는 오기가 생겼다.
얼떨결에 오너가 돼 티잉 그라운드에 올랐는데 멀리 호두나무 한그루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스윙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소리는 좋았다. 그리고 볼이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페어웨이 한가운데 언덕 밑에 떨어져 한참을 굴러갔다.
다음 티 샷을 하게 된 미국인 친구는 그 순간 힘이 들어간 것 같았다. 헛 스윙만 다섯번, 그러나 볼이 하늘로 높이 솟아 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당연히 전반 나인홀동안 나는 선두였고 내 파트너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코스에서 내 지도를 받느라 진땀을 흘렸다.
거리는 길고, 페어웨이는 좁은 어려운 코스였지만 슬슬 「후반 9홀은 파 플레이로 끝내 이 친구들을 기절시켜 버릴까」하는 욕심이 생겨났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힘을 이 곳에서도 과시하는구나」하는 난데없는 애국심까지 솟았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 10번홀부터 내 샷에는 힘만 잔뜩 들어가고 동반자들은 유연한 스윙으로 나보다 30야드씩 앞서 갔다.
결국 그렇게 한순간의 아메리칸 드림은 막을 내렸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욕심을 내면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골프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겨 넣은 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