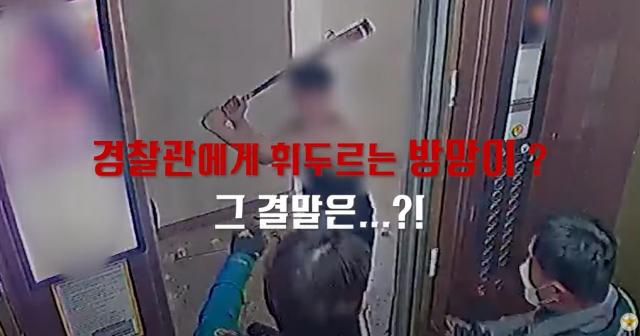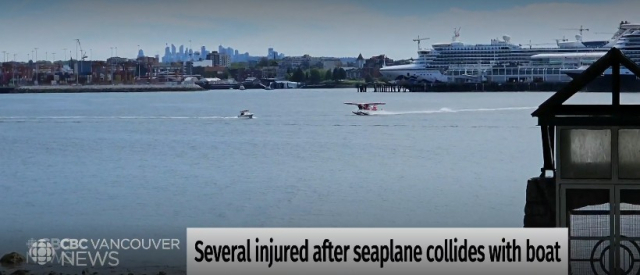미국발 금융부실로 세계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고작 1조달러(?) 남짓한 데 비해 전세계가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전세계 금융기관의 손실액은 이미 1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55%를 차지하는 선진국 경제는 동반 침체에 돌입했고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 경제 역시 미국발 부실의 유탄을 맞아 흔들리고 있다.
위기가 이렇게 커진 데는 미 금융당국이 시장 스스로의 치유를 기다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여러 차례 수습할 기회가 있었다. 혹자는 미 금융당국이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붕괴를 방치한 것을 최대 패착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멀리는 지난해 말 ‘슈퍼펀드’ 설립 계획이 월가의 이기주의로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미 재무부는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폭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800억달러 규모의 ‘슈퍼펀드’ 조성 계획을 월가에 제안했다. 월가 금융기관이 자금을 갹출, 공동 펀드를 조성한 뒤 부실 자산을 사들이자는 구상이었다. 배드뱅크를 설립하자는 이 계획은 부실 규모가 가장 컸던 씨티그룹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씨티의 위기 수습은 월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큰 그림에서 출발했다. 이 계획에 상업은행은 찬성한 데 비해 투자은행들은 미적댔다. 표면상의 반대 이유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것이지만 경쟁업체의 구제에 왜 자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이기주의 논리가 깔려 있었다.
슈퍼펀드는 결국 무산됐고 이에 반대했던 투자은행들은 차례로 무너졌다. 반면 상업은행들은 부실은 많았지만 고객 예금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 등 유동성이 뒷받침되면서 현재까지 건재해왔다. 슈퍼펀드는 정확히 1년 뒤 미 재무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계획(TARP)으로 발전했다. 재원조달에서 TARP가 국민 세금이고 슈퍼펀드는 월가 자체 자금이라는 것만 다를 뿐 개념과 목적 등이 거의 동일하다.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자본 확충에 공적자금을 우회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간접적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경쟁업체의 몰락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월가의 몰락은 크고 작은 금융기관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카운트파트너 리스크’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은 내 몫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시장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이것은 월가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교훈이다.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