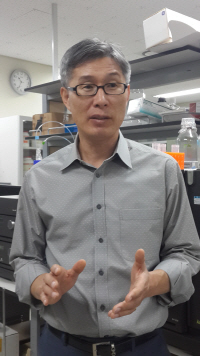|
"기후변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에볼라 같은 질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에볼라 백신을 개발해 동물실험을 앞둔 설대우(48·사진) 중앙대 약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에볼라 감염·확산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전세계 에볼라 감염자는 지난 14일 기준 9,216명, 사망자는 4,555명. 실제 치사율은 70%를 넘는다. 확실한 치료약이나 예방백신도 없다. 혈액·체액으로만 전파돼 호흡기 질병보다는 감염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일단 감염자가 확인되면 과거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기 어렵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각국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설 교수는 "감염자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높지만 이에 대응하는 선진 방역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발병·확산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볼라 특성상 초기 보균자라도 미열 등 병증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전염시킬 가능성은 적다"며 "감염 의심자에 대한 초기 검역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가령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병국과 인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일대일 체크하고 미열 증상이라도 보이면 즉각 격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백신이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탓에 전세계적으로도 백신 개발이 더디다. 설 교수 연구팀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해 연구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없앴다. 독성이 강한 에볼라 바이러스 전체를 이용하는 대신 우리 몸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로 인식할 만큼의 당단백질(glycoprotein)만 따로 떼어내 덜 위험한 감기 바이러스에 넣어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설 교수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위험성이 높은 다른 질병 백신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기술"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며 다음달 캐나다 국립미생물연구소에서 동물실험도 진행한다. 그는 "항체 생성이 확인돼 백신으로서 기능을 갖췄다"며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동물실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도 거쳐야 하지만 만약 에볼라 확산이 최고 위험 수위에 달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백신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 교수 연구팀은 지난 8년 동안 백신 기반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으며 올 들어 에볼라가 창궐하자 백신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바이러스 등을 취급할 때 요구되는 생물안전등급(BSL) 최고 4등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캐나다 미생물연구소가 이번 동물실험 비용 일체를 부담한 것도 연구팀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백신 연구지원은 사실상 걸음마도 못 뗀 수준입니다. 에볼라처럼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갈 질병에 대한 연구 기반이나 전문가 풀은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연구자들이 매년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팔짱만 끼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백신 연구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는 국민들이 에볼라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손 씻기 외에 사실상 다른 방도가 없는 만큼 전염 차단은 전적으로 방역당국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백신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궁극의 치료제"라며 "앞으로 기반기술을 이용해 C형간염 등 아직 예방책이 없는 치명적 질병의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