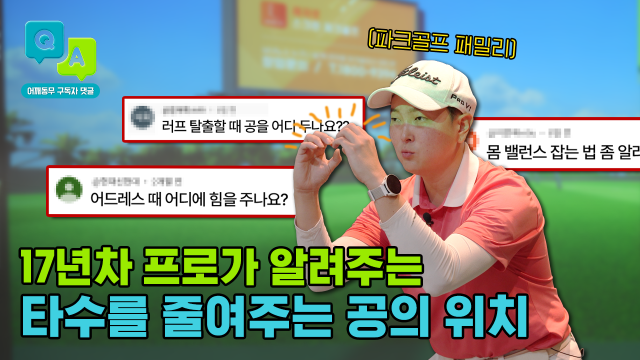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
10개주의 경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6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중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각종 언론들은 시시각각으로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당내 보수주의의 지원을 받는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부상해 대세론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흥행의 요소를 갖췄음에도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던 민주당 경선에 비해 관객들의 호응은 한결 처진다.
지금까지 전개된 공화당 경선에서 각 후보들은 당내 보수세력을 껴안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중도파로 본선경쟁력을 내세우는 롬니 전 주지사도 20여 차례의 진행된 후보토론회 때마다 자신이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강조해야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주장을 보고 토할 뻔했다고 한 샌토럼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수용하는 대신, 케케묵은 보수 색깔의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누적된 국가채무를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작은 정부, 낮은 세금, 시장 우선 등 종래의 신자유주의를 되뇌고 있을 뿐이다. 이래서는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미국의 양당제 정치에서 공화당은 보수주의 정당이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힘은 현실이다. 보수주의는 자유ㆍ평등ㆍ박애라는 숭고한 이상을 내세웠던 프랑스 혁명이 현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반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나타나자, 이에 반발해 태동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니스벳 교수는 보수주의자들은 사적 생활,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산 있는 곳에는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20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이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35%는 민주당, 25%는 공화당 지지자인데 비해 중도성향의 무당파는 40%나 차지하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당파의 마음을 사야 한다.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에 전념하는 무당파를 잡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모두 당을 떠나 국민들의 욕구를 포착, 어젠다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