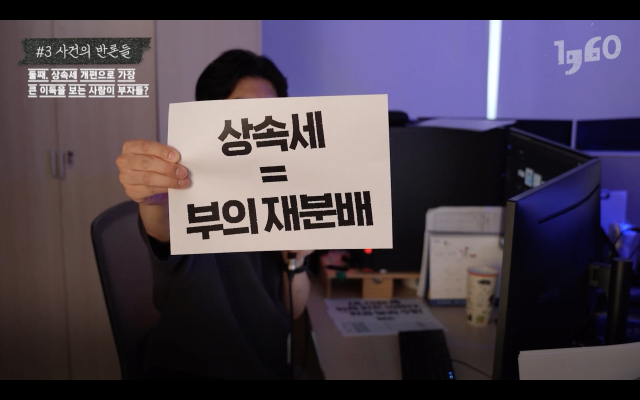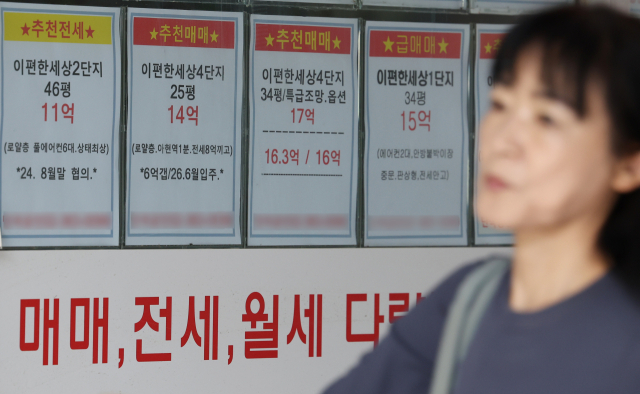지난해 이맘때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한창이던 정부 고위관계자가 들려준 흥미로운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G20을 준비하려고 일단 20개 회원국 주요 신문에 난 관련기사를 다 모아봤죠.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나라 정상ㆍ장관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보도한 거에요. 그 중 절반은 실제 회의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 했는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G20 관련 외신 반응이라는 비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유력 외국언론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미스터 윤'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언급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윤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얼굴을 맞댄 사진을 게재한 월스트리트저널과 윤 장관을 단독 인터뷰한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별도로 첨부해 친절한 설명까지 달아 놓았다. 여기다 재정부 트위터에는 아예 기사 전문을 사진을 찍어 올리기까지 했다.
기자는 정부가 G20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애쓴 장관의 활약상을 가감 없이 전했다고 믿는다. PI(최고경영자의 이미지 마케팅)마인드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홍보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는 나라의 정부가 외국 신문에 장관 사진이 잘 실렸다고 반색하는 건 촌스럽다. 장관 기사가 크게 실리는 게 큰 의미가 있다 해도 그것은 독자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지레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콘텐츠다. 사진이 몇 장 실리고 장관 이름이 몇 번 언급됐는지에 천착하는 건 몸통은 외면한 채 꼬리에만 집착하는 격이다. 국격에 걸맞게 국제금융사회에서 제대로 된 논리를 개발해 힘있게 주장하면 홍보는 저절로 되고 국격도 알아서 올라간다. 우리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측정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제금융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 받은 나라다. 정부의 '자화자찬'식 외신 과민반응은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는 세계인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