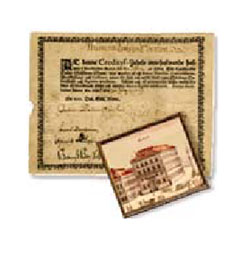홈
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16일] 은행권
입력2008.07.15 17:59:13
수정
2008.07.15 17:59:13
19.75㎏. 스웨덴 크리스티네 여왕이 발행한 10탈러짜리 동전의 무게다. 금과 은이 부족해지자 구리 매장량이 풍부한 스웨덴은 구리를 정화(正貨)의 재료로 삼았지만 은화 가치와 같은 동전의 무게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주머니에 있어야 할 동전이 마차에 올랐다.
스웨덴의 고민은 종이돈으로 풀렸다. 국왕 구스타브 10세의 총애 속에 스톡홀름 은행을 세워 운영하던 네덜란드 출신 상인 요한 팜스트러크가 1661년 7월16일 지폐를 찍어낸 것이다. 그가 지폐 발행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바탕은 네덜란드에서의 경험.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던 네덜란드 시민들이 물자가 부족했을 때 한시적으로 종이돈을 제작ㆍ사용했다는 간접경험이 유럽 최초의 종이돈 발행을 이끌었다.
일찍이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지폐가 사용되고 십자군전쟁 이후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은행에서 어음이나 영수증이 화폐처럼 쓰인 적은 있었지만 화폐 유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종이돈이 발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5~1000달러짜리 구리돈은 물론 10ㆍ25ㆍ50ㆍ100달러 은화도 대체했던 스톡홀름 은행권은 얼마 안 지나 가치가 떨어졌다. 마구잡이로 발행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탓이다. 팜스트러크의 체포와 사형선고ㆍ사면이라는 홍역을 앓고도 스웨덴은 종이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톡홀름 은행을 인수해 중앙은행으로 확대 개편(1668년)하고 지폐를 정착시키려 애썼다. 종이돈의 효율성을 살리고 싶어서다. 스톡홀름 은행의 은행권 발행 이후 종이돈은 급속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근대식 지폐의 등장 347주년. 예나 제나 ‘통화 가치 안정’은 경제운용의 기본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지폐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악마의 잎사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