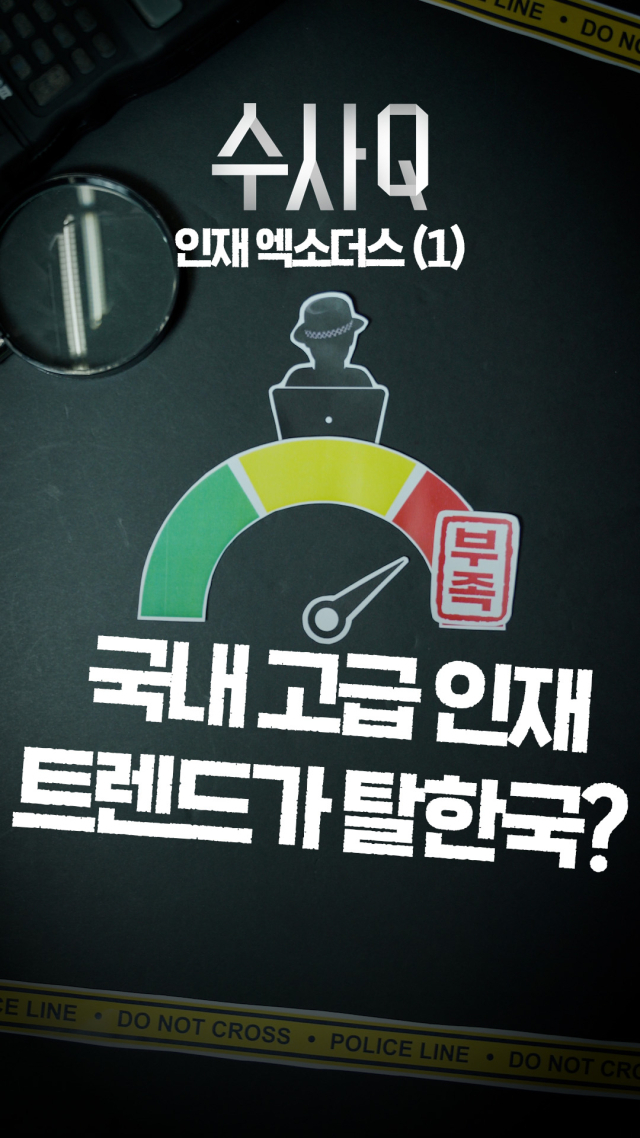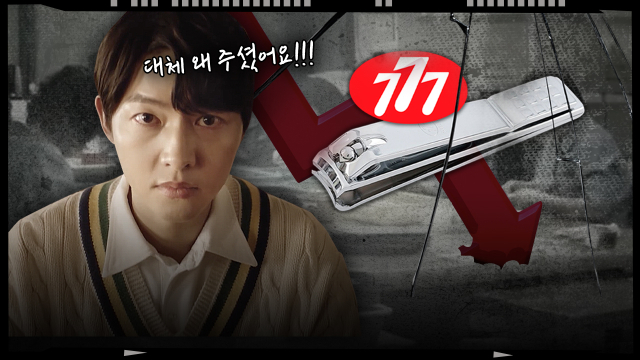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의 비리혐의 구속은 도대체 이 사회의 비리의 끝이 어디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현정부들어 16명의 은행장이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했고 그중 5명은 구속됐다. 이같은 참담한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은행장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고 그 수법은 전문가답게 교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손행장의 비리혐의는 95년 한 부실기업에 2백54억원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해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가 은행장에 취임한 것이 94년 초의 일이므로 이번 비리의 시기를 전후해서는 다른 비리가 없었을지 궁금하다. 대출사례비조의 뇌물이 오가는 것은 금융계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행에 비추어 그의 비리혐의는 추가될 소지가 많고, 금융계 전체에 비추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검찰은 본질은 놔둔채 그때그때 대증요법만 써왔다. 이번에도 검찰은 『2∼3명의 행장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지만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어정쩡한 자세다.
투서 한장이면 은행장들이 줄줄이 물러나는 조직에서는 투서가 판치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 투서가 가장 판을 치는 곳으로 금융계가 꼽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장은 왜 그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가. 우선 직원이 수천 수만명씩이나 되는 은행의 대표관리자로 판공비 소요가 클 것이다. 각종 연이 판치는 사회구조라 예금유치비도 많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돈이드는 큰 구멍은 보호막 유지비 일 것이다. 앞의 두종류의 경비는 공개처리도 가능하고 모자라면 증액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막 유지비는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처리도 어렵다.
은행장이 되려면 또 되고나서 유지하려면 관계와 정치계에 방풍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다. 은행장 인사를 자율에 맡긴다고 했으나 관계와 정계의 입김은 여전하다. 하다못해 친목단체인 은행연합 회장의 선거에도 영향력이 행사되는 마당이다. 은행장이 부정대출의 커미션으로 보호막 유지비를 충당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범죄적 거래에 다름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 뿐이다. 은행장 선임과 경영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은행장은 경영에만 신경을 쓰도록 해야한다. 은행의 자율성 확보와 비리가 온존할수 있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늦출수 없다. 이번 사건은 금융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