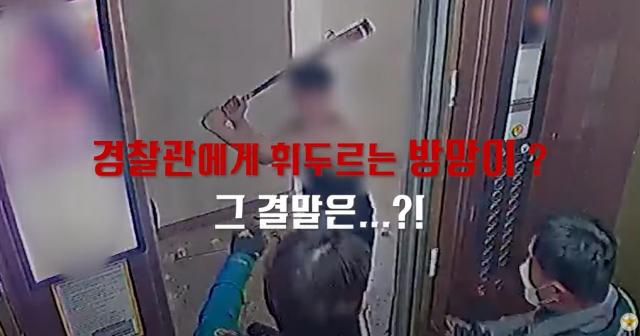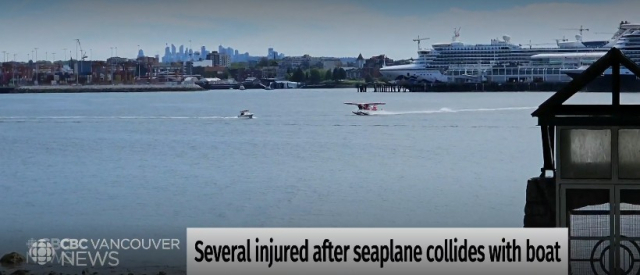정부가 1ㆍ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펀드 조성과 수익률, 사업시행자 등에서 거듭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91조원의 펀드를 연기금 등에서 투자 받고 연간 5,000억원만 재정에서 추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을 6%에 맞추려면 가구당 수백만원 가량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며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떨어져 10년 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다시 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1ㆍ31 대책을 통해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미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소형 서민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주공이 그대로 맡되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은 토지공사가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주공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사업은 주공이, 토지조성사업은 토공이 맡도록 한다는 역할분담 원칙을 정했는데 이제 와서 그 원칙을 허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지원이 모자라는데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에 수천억원씩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공측 주장이다. 결국 준비도 제대로 안된 가운데 비축용 임대주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주공과 토공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 자본금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에도 주공은 28조원, 토공은 19조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매년 두 공기업의 부채가 수조원씩 늘어나고 있어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두 회사는 높아진 부채비율 때문에 자금조달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국책사업이 자금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예산마저 낭비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임대주택이 과연 주택시장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