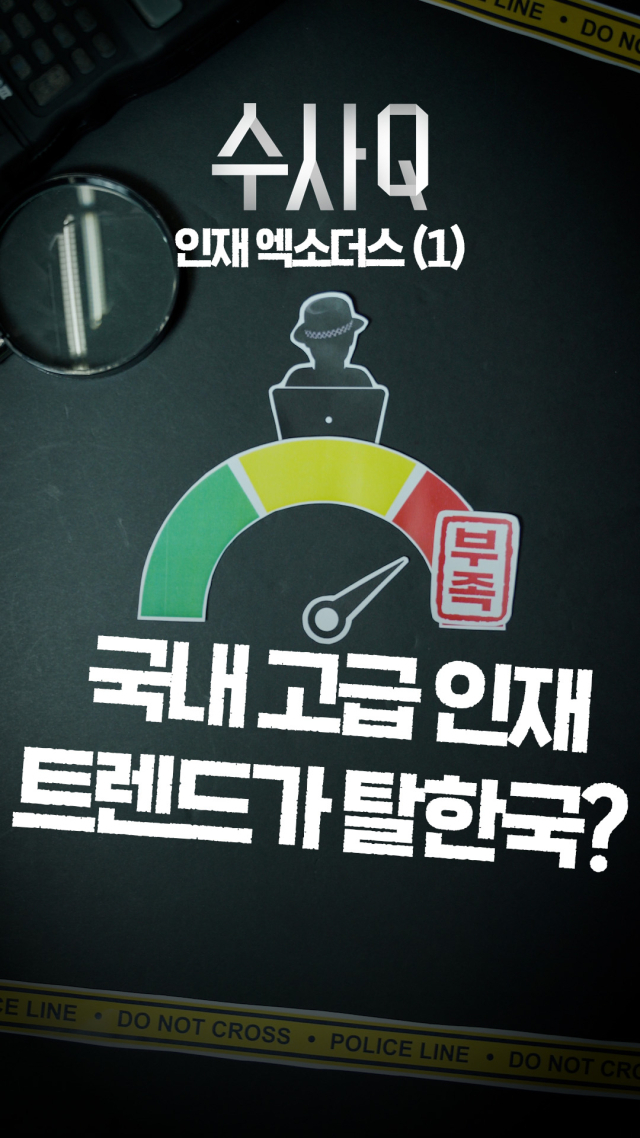|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
국내 포털·이동통신사 등 152개 사업자가 지난 2011년 감청을 위해 국가기관에 제공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계정(ID) 건수를 인구 대비로 분석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총 7,167건의 감청이 이뤄졌고 이를 인구 대비로 분석하면 미국은 1만명당 0.085건, 일본은 0.002건인 반면 한국은 1.46건에 이른다. 지난 한해만도 1,000만건의 이통사 고객정보가 수사당국에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검열'은 빈번한 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1~2%일 정도로 낮아 감청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한국 사회에 '사이버 검열'이라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카카오톡(카톡) 검열'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카톡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IT코리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국내 메신저·포털 등 인터넷에 대한 불신은 사이버 망명으로 연결되며 '텔레그램' 한국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에 계정을 둔 G메일·페이스북 등의 인기도 치솟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 검열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이번 '카카오톡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IT 업계는 과거 두 차례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국내 시장을 외국계 기업에 상당 부분 넘겨준 아픈 기억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검열 자료요청 및 제공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검찰이나 경찰의 영장 집행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보호' 원칙을 세우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지나치게 빈번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 실정법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검열에 대한 일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한 것도 정보제공의 '사회적 합의'가 선결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느냐 여부"라며 "각 당사자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