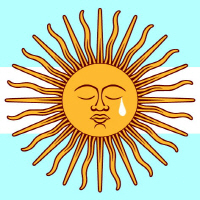|
아르헨티나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이 아니라 1890년 런던 얘기다. 늘어만 가는 설비로 생산이 넘치고 금리가 떨어지자 런던 금융가의 선택은 신흥국 투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고금리 토지담보채권이 인기를 끌었다. 결과는 거품 경제. 아르헨티나 버블이 꺼지며 베어링사를 비롯한 영국 자본은 위기에 빠졌다. 마침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대규모 국방투자(목조전함 철갑화) 직후여서 돈의 씨가 말랐던 상황이다.
△영란은행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사방에 손을 벌렸다. 유대계 로스차일드는 물론 프랑스와 러시아가 나선 결과 아르헨티나 사태는 진정국면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신흥국 위기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공조 덕분에 극복될 수 있었다. 18세기 초중반 두 차례의 미국 공황을 신흥국 위기의 시발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당시의 미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진입했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 자본도 19세기 말 아르헨티나 위기에 돈을 보탰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황금기는 제 2차 세계대전기. 연합국에 쇠고기를 팔아 세계 7개 부국으로 손꼽혔다. 기술 수준도 높아 1946년에는 남미 최초, 세계에서 5번째로 제트전투기를 개발해냈다.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 부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망가지고 정치도 혼란을 겪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남미 3대 강국의 하나다. 천연자원과 드넓은 목초지 등 잠재력도 무한하다.
△문제는 신흥국 위기의 반복성. 선진국 경기의 부침이 그대로 전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지만 요원하다. 현지에서는 정부가 달러를 통제하는 가운데 보통사람들의 해외 직구매가 늘어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은 남미경제 쇠퇴의 원인을 '외국산 제품을 경계하지 않는 경향'에서 찾았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라틴어의 은(銀)에서 국명이 유래했으나 돈에 우는 아르헨티나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권홍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