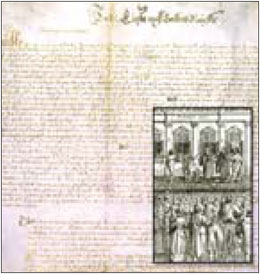|
'대헌장,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법의 바이블.' 18세기 영국 총리를 지낸 윌리엄 피트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에 대한 평가다. 각종 교과서에서 영국 의회민주주의 이정표로 나오는 권리청원의 밑바닥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 돈과 피. 영국 의회가 권리청원을 마련한 시기는 1628년 3월.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며 의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국왕 찰스 3세는 의회의 청원을 3개월 동안 만지작거리다 6월7일 마지못해 서명하고 말았다. 억지로 짜낸 건함세로도 스페인과의 전쟁비용을 감당할 수 없자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고 요구를 들어줬다. 의회는 11개 조문으로 이뤄진 권리청원의 핵심 내용을 제1조에 못박았다.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대헌장(1215년)의 내용이 재확인된 것이다.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 돈이 궁해졌음에도 장로교를 신봉하는 스코틀랜드에 영국국교회(성공회)를 강요하며 종교전쟁을 유발해 의회에 손을 벌렸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왕에게 의회가 협조할 리 만무. 분노한 찰스 1세는 의회를 수 차례 해산하며 증세정책을 강행한 끝에 불만을 야기하고 끝내는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권리청원은 영국사에 내전과 공화정ㆍ왕정복고라는 혼란을 가져왔지만 '법의 지배' 원칙을 확고하게 심었다. 선왕인 제임스 1세에게도 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대법관 출신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코크가 마련한 권리청원의 인권보호 정신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찰스 1세가 종교와 내치ㆍ외교에서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벗어났다면 권리청원은 피를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도자의 편협은 자신의 불행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