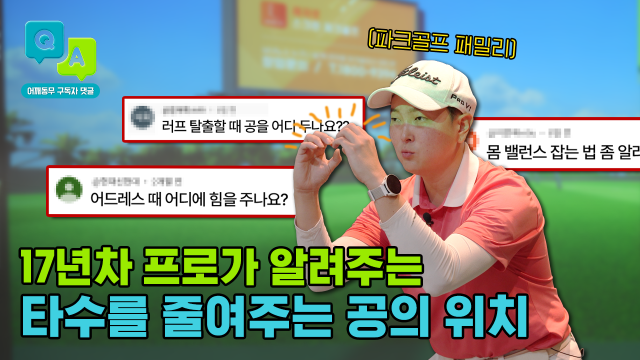미국 대선 제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대선 때는 당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게 지고서도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에 당선돼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지금은 민주당 경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 방식이다. 먼저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예비선거에서 대의원을 확보하고,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11월 초 대선 당일에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아닌 각 당이 내세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정작 대통령은 이 선거인단이 12월에 뽑게 된다.
현재까지 예비선거를 보면 공화당에서는 존 매케인 후보에게 판세가 기울었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진행 중이다. 최근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슈퍼화요일 후 8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역전승을 배제하긴 어렵다.
최근 민주당 경선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아무리 적임자를 뽑기 위한 진통이라 해도 1월에 시작된 예비선거가 8월 전당대회나 가서야 결론이 나는 것은 분명 경선제도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따른 국론 분열, 현 대통령의 레임덕 등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에도 타당한 측면이 제법 많다.
특히 비판론자들은 민주당 경선 제도가 공화당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고 말한다. 공화당은 예비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대의원을 독식하는 방식이지만, 민주당은 득표비율로 대의원을 나눠 가져간다. 경선 제도가 패자에게 너무 유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민주당은 상ㆍ하원의원 및 주지사 등으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화당에 없는 이 제도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른바 ‘성골’들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데 어떤 제도가 정답일 수는 없다. 대선제도는 그 나라 역사와 문화ㆍ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간섭하지만 선거제도만큼은 후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