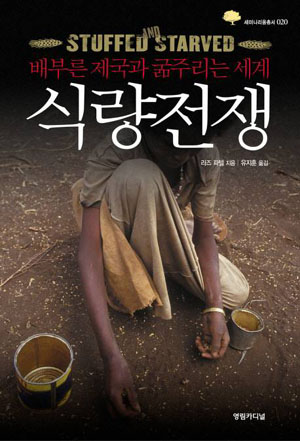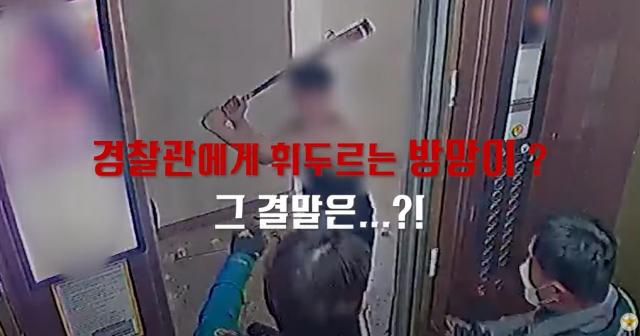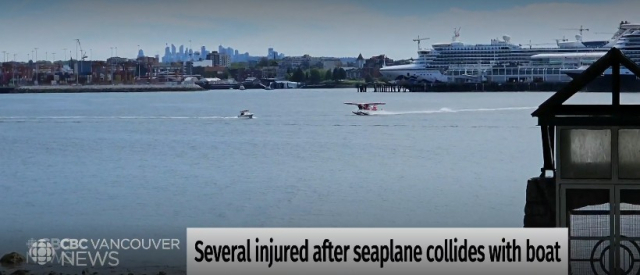식량전쟁-라즈 파텔 지음, 영림카디널 펴냄<br>식품업계 대기업과 유통구조의 모순 추적
40대 주부 김성희씨는 주말이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집 근처 대형마트다. 일주일치 먹거리를 미리 사둘 요량으로서지만 각종 음식 재료와 공산품이 깔끔하게 진열돼 있어 건강을 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코넬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비영리연구교육기관인 ‘푸드퍼스트(Food First)’에서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그러나 대형마트에는 진정한 선택이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과일은 살충제와 제초제에도 살아남은 그러면서도 먹음직스러운 품종이거나 유전자를 조작한 신품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선과 가축 역시 항생제에 강력한 내성이 길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과를 보자. 북미와 유럽지역 대형마트에서 거래되는 사과 품종은 반질반질 윤기나는 것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거리 운송에도 모양이 변질되지않는 품종만을 선호하는 유통업체의 선택이다.
최근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역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음식의 생산과정 즉 푸드체인에 있다. 커피를 예로 들어보자. 커피 생산자가 커피 가공업체에게 넘기는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14센트. 그러나 네슬레, 스타벅스 등 가공회사의 공장 문을 나서면 같은 양의 커피는 26.40달러로 200배 가까이 가격이 뛴다. 수익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현재의 유통체제로 인한 모순을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과체중으로 비만을 호소하는 인구가 10억명에 이르고,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 역시 8억명을 넘어서고 있어 음식을 선택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상승의 피해까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문제는 몬산토ㆍ카길 등 농산물의 가격을 좌우하는 대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 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책은 식량유통의 은밀한 실체에 접근해 그 실상을 파헤치고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책은 낭떠러지로 내 몰린 농민들의 자살로 인한 사회 문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비만과 기아가 공존하는 식량 문제를 식품업계와 유통업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멕시코, 인도 그리고 한국 등을 방문, 농민과 소비자들을 만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심층분석했다. 2003년 세계무역기구의 장관급 회담이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몸을 던진 이해경 씨 사건도 자세하게 다룬다.
대안도 소개한다. 경제 구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죄우된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만 식품업계를 통한 정치 문제는 물론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