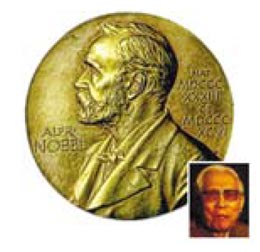|
표면이 순금으로 도금된 18K 금메달, 상금 1,000만스웨덴크로네.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우리 돈으로 16억8,240만원인 상금도 상금이지만 노벨평화상은 선망의 대상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명예까지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수상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상자격 시비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노벨평화상이 처음 제정된 1901년부터 지금까지 수상자는 개인 135명과 28개 단체. 노벨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수상자는 개인이 136명이어야 하지만 한 명이 빠졌다. 그는 누구일까. 1973년 10월16일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함께 공동 수상자로 지명된 베트남의 레둑토(黎德壽)다. 두 사람이 선정된 이유는 베트남 전쟁 휴전을 위한 파리 평화협정의 주역이었기 때문. 키신저는 기쁘게 상을 받았지만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해 파문을 던졌다. 외신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 조국의 전쟁상태가 끝나지 않았다. 평화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레둑토는 1975년 동양인 최초의 노벨평화상보다도 염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뤘다. 노벨평화상은 우리와도 인연이 있다. 추문도 남겼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상황 개선, 북한과 평화를 추구한 공로로 상을 받을 때 노벨위원회에는 선정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한국인들의 편지가 빗발쳤다. '같은 나라 국민으로부터 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를 받기는 처음'이라던 당시 노벨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대조적이다. 투서까지 동원해 모함한 대한민국과 당당하게 거절한 베트남. 노벨평화상이라는 프리즘으로만 본다면 지금의 경제수준 차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