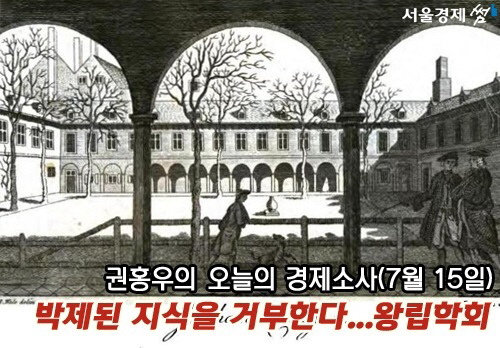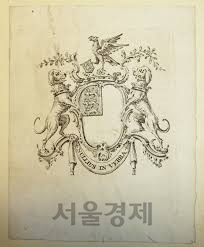문제 하나. ‘어항에 살아 있는 붕어를 넣으면 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죽은 붕어를 넣으면 무게가 늘어난다. 왜 그럴까?’ 당대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즉답이 나오지 않았다. 질문을 던진 주인공이 영국 국왕 찰스 2세였기 때문이다. 왕의 권위 앞에서 학자들이 미적거리는 순간 젊은 학자가 의견을 내놓았다.
‘실험을 합시다. 현상을 토론하기보다 실험이 우선입니다.’ 학자들은 선뜻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왕의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신수설의 신봉자로 알려진 찰스 2세의 그릇된 인식이 실험으로 밝혀지면 불경죄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도 결국 실험이 진행됐다.
결과는 찰스 2세의 통념과 달랐다. 어항의 무게는 산 붕어나 죽은 붕어를 넣어도 똑같았다. 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국왕의 처분만 기다렸다. 찰스 2세는 젊은 과학자와 어항을 번갈아 보면서 짧지만 점잖게 말했다. ‘Odd Fish!’ 직역하면 ‘기묘한 물고기’라는 뜻이다. 오늘날 실생활에서는 ‘똑똑한 사람’ 또는 ‘네가 맞다’는 의미로 쓰인다.
찰스 2세와 기묘한 실험을 했던 학자들의 모임은 왕립학회. 정식 명칭은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Royal Society of London for the Improvement of Natural Knowledge)’다. 왕립학회의 문장(紋章·arms)에 적힌 라틴어 문구 ‘nullius in verba’(Take nobody‘s word for it!)는 물고기 실험의 정신을 상징한다. 직역하면 ’누구의 말도 그대로 취하지 말고 아무 것도 믿지 말라‘는 의미다.
왕립학회 창립자들은 추상적 관념보다 실증적 실험을 중하게 여겼다. 위의 라틴어 모토 역시 이렇게 풀이했다. ‘무엇이든 검증하기 전까지는 믿지 말고 한 번 검증했어도 믿지 말며 이미 다 된 것도 또 의심하라. 아무 것도 그냥 믿지 말라.’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과학자들의 인식은 시대 정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우선 중세적 종교관이 의심받던 시대였다. 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세계관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을 비롯한 과학의 발달로 근거를 잃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연역법)의 권위도 흔들렸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1620년 ‘신기관(Novum Organum)’을 통해 설파한 ‘관찰이나 실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명제는 우상(偶像)일 뿐이다’라는 명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실험과 검증, 자료수집을 중하게 여긴 모임의 출발은 1645년께부터. 영국에 막 들어온 커피하우스에서 내전의 동향과 과학을 토론하던 젊은 학자들이 옥스포드대학 그레샴 칼리지에서 모여 정기회합을 가진 게 시초다. 새뮤얼 핍스의 일기에 따르면 1660년 11월 과학학회를 정식 출범시킨 이들은 1662년 7월15일 국왕 찰스 2세의 칙허를 받았다.
‘왕립(Royal)’이라는 칭호까지를 얻은 학회는 눈부시게 발전해 나갔다. 현미경을 사용해 세포(cell)존재를 규명했으나 뉴턴에 가려 빛을 못 본 로버트 훅이 실무를 맡아 뛰어난 과학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훅과 천적이던 뉴턴도 들어왔다. 근대 과학과 천문학·수학 발전을 이끌던 왕립협회가 1665년부터 펴낸 ‘철학회보’는 최초의 정기 간행 학술지로 꼽힌다.
학자들의 자비로 운영된 왕립학회는 순수 과학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쿡 선장의 태평양 탐사를 지원하고 정확한 경도 측정으로 해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해상시계 발명에도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아프리카 오지까지 소속 과학자들을 보내 뉴턴 이론을 깨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을 증명한 업적으로도 유명하다.
왕립학회는 유럽 전체의 과학 수준도 끌어올렸다. 영국에서 왕립학회의 성립에 자극받은 프랑스는 1666년 왕립과학아카데미를 세웠다. 영국과 프랑스의 왕립학회와 왕립과학아카데미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독일과 스웨덴 등의 비슷한 학회 결성도 자극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과학의 폭발적 성장은 각국으로 퍼진 과학아카데미즘의 덕분이다.
문턱도 낮았다. 신분과 학벌에 관계없이 재능이 있으면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패러데이가 정회원으로 우대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논문 현상 공모를 통해 우수한 과학자들이 신분과 학력에 관계없이 재능을 뽐낼 수 있었다. 과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열정과 열린 문은 인문 사회학 분야로도 퍼졌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장자크 루소도 프랑스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공모에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서 일약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영국은 물론 유럽의 도약을 뒷받침한 셈이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우리를 본다. 한국에서도 ‘오드 피시’가 빛을 볼 수 있을까. 크고 작은 각종 학회는 논문의 질보다 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부터 따진다. ‘권위’ 있다는 한림원은 ‘원로’들의 박제된 지식이 모인 양로원 격이다. 학문의 진입 장벽과 카스트 현상이 지속되는 한 노벨상만 80개를 수상한 왕립학회 수준에의 도달은커녕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도 요원할 뿐이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