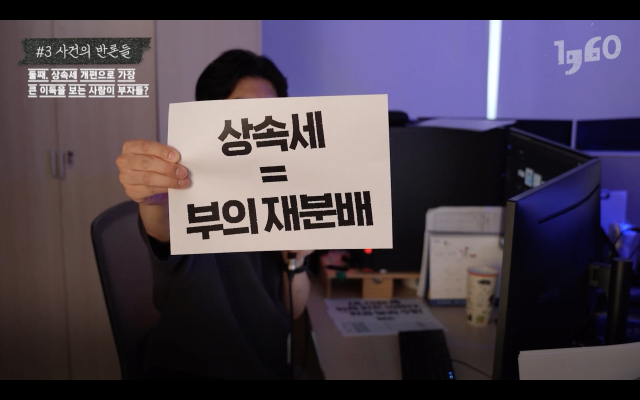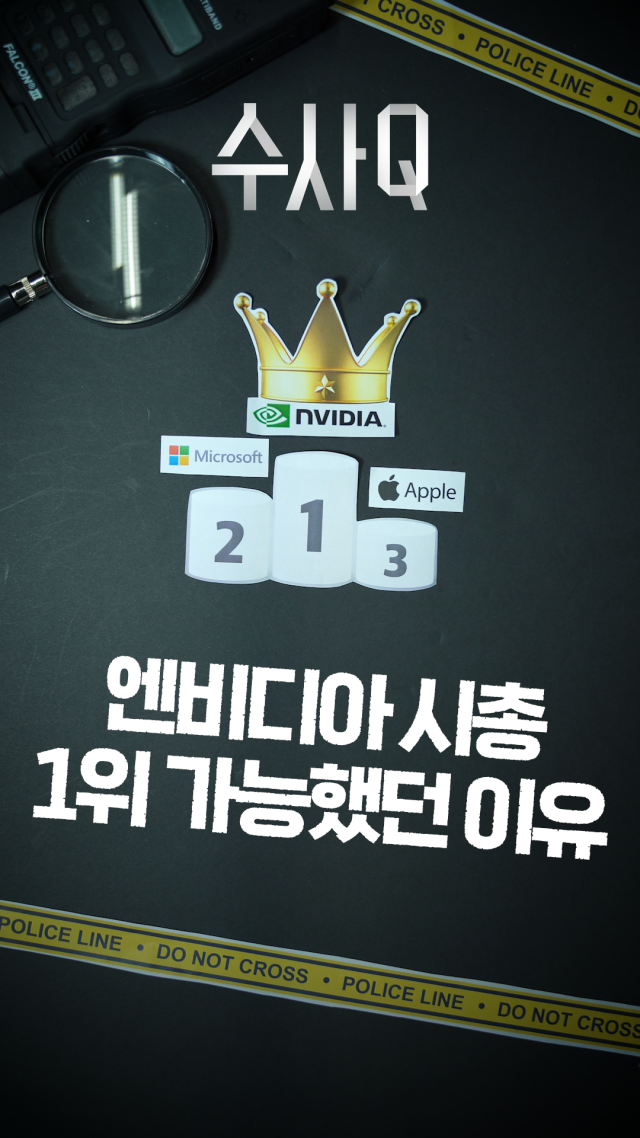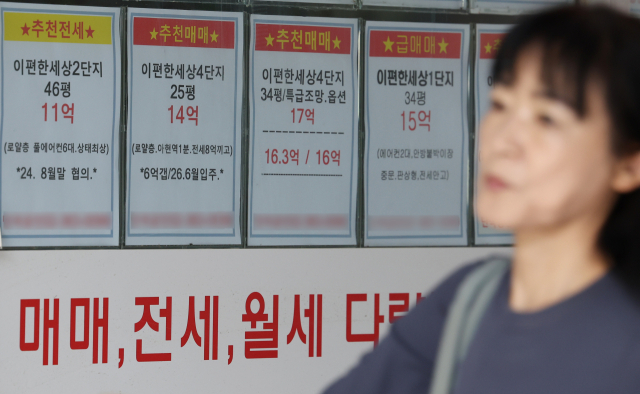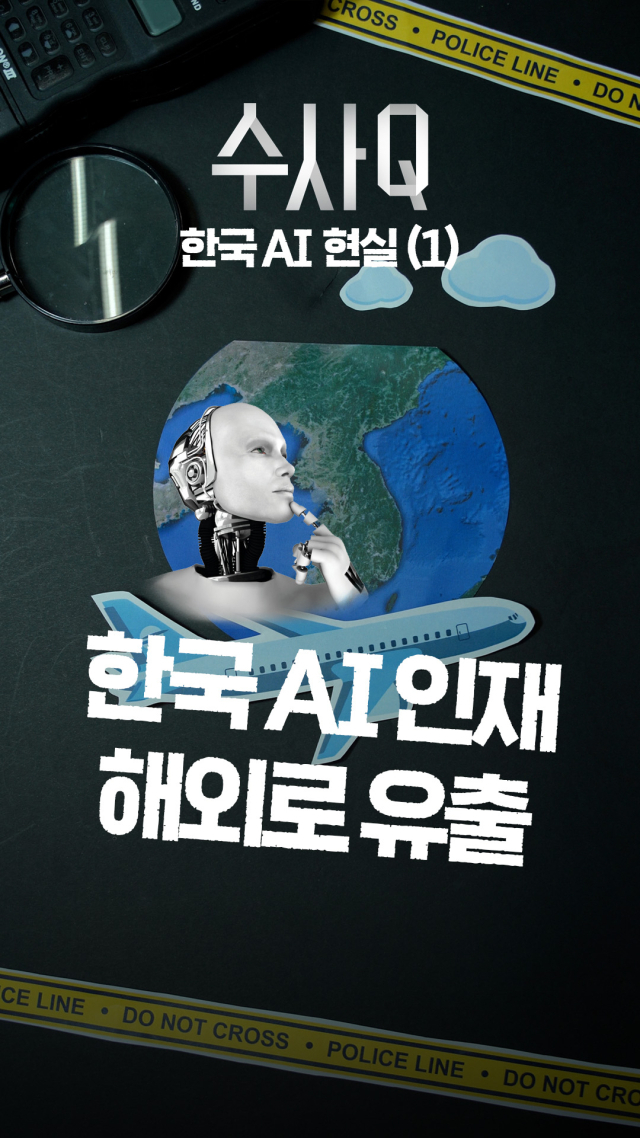고용악화는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조업 고용감소 추세를 설명할 수는 없다. 힌트는 일자리 구조변화에 있다. 2011년 이후 올 8월까지 제조업 일자리는 고작 4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서비스업은 3배나 많은 120만명이 증가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의 선봉에 선 셈이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생산·건설·사무직 등에서 31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금융·보건의료·의료기술직 등에는 704만명이 새로 취업했다. 각국이 서비스 산업에 목을 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 서비스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뒤처져 있고 1인당 노동생산성도 1만달러나 모자란다. 정보통신·문화콘텐츠·의료 등 혁신형 고부가 업종 대신 숙박·음식점 등 저부가 업종만 늘어난 탓이다. 이래서는 저질의 일자리만 늘릴 뿐 고용시장 안정이나 청년실업 완화는 꿈도 못 꾼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 경제의 당면 핵심 구조조정 과제 중 하나로 서비스 부문을 지목했을까.
해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때 통과됐어도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일본에서는 허용하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을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5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고용창출의 최일선에 있는 서비스업의 발목을 이렇게 묶어두고 고용확대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20대 국회가 19대와 달리 민생 우선을 실천하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