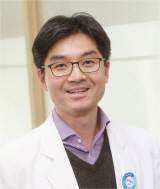2011년 게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세계 최초로 대학병원에 게임 관련 환자 전문 치료 수도권 허브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열었다. 이후 6년 동안 1,000여 명의 환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었다. 이 일을 하면 느낀 건 부모와 기성 세대가 게임과 IT,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 환자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 뿐 아니라 드라마나 웹툰 보기, 친구들과의 소통, 공부 관련 검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부모는 스마트 폰을 들고 있으니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며 그만하라고 채근한다.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그런 상황이 갈등으로 이어진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 게임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의학연구를 살펴보면, 게임사용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70% 이상, 많게는 80% 되는 아이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 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족 관계의 현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치원 가기도 전부터 맞벌이 등으로 부모의 관심과 통제밖에 있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나 운동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긴 어렵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바쁘게 돈을 벌어서 공부 시켜 주는 데, 밤낮 스마트 폰만 붙잡고 있니?”라고 나무라며 모든걸 아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치료는 먼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현재가 어떤지를 깨닫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심리검사, 전문적 면담 설문지,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아이와 함께 검증하고 고민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자각하고, 원인을 찾게 된다. 그렇게 찾은 원인은 대부분 공존 질환인 경우가 많다. 공존 질환의 치료는 심층적 면담, 인지행동치료, 약물 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족도 준비돼야 한다. 아이를 과도한 통제도, 무관심도 아닌 ‘독립성’을 만들어 줄 가족 관계 시스템을 위해 가족 치료가 실시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부모 혹은 가족 보호자들에게 최소한의 게임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과의 게임 혹은 IT 지식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의 치료 원칙은 이해와 지식이 바탕이 된 종합적인 치료다. 거기엔 게임 문화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게임에 과몰입한 사람과 주변 환경, 가족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그 이후 적절한 상담 및 약물 치료, 통제 시스템 구축, 가족 치료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치료와 관심을 통해 게임 문화 강국의 위상 유지와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