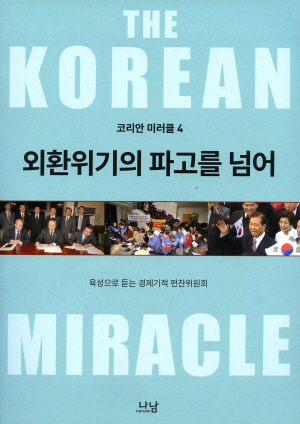지난 1997년 12월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박혀 있다. 이날 당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역사는 이날을 한국이 경제 주권을 잃은 ‘국치의 날’로 기록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6년 11월30일, ‘국치일’을 며칠 앞두고 당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경제수장들이 서울 플라자호텔에 모였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20년 전 외환위기에서 가까스로 건져낸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가라앉는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전직 경제수장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역대 경제 수장들의 충고는 깊고 날카로웠다. 전직 경제장관들은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나같이 강조했다.
1998년 3월부터 1년2개월간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임의 가장 원로로 현 경제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어려움은 단순히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진작하는 경기대응 대책으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새로운 이념의 설정,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새로 일고 있는 내셔널리즘,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심을 잡으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에 이어 2000년 초반까지 재정경제부를 이끈 강봉균 전 장관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섞어 현 시국에 대한 해법을 풀어냈다. 그는 “돌이켜보면 30년 전 대통령직선제를 성취하며 정치 민주화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했지만 국가 경영이 선진화된 게 별로 없다. 또 20년 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경제구조를 개혁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성장 잠재력은 날로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론을 강조하는 현 경제팀을 향해 반론을 폈다. 그는 “경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당장 정치적 혼란에서 오는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경제 활동은 큰 차질 없이 살아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거버넌스(국가 경영) 체제를 경제가 더 정치 중립적으로 굴러가는 체제로 가면 우리 경제는 옛날의 잠재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최대 난제인 구조조정을 집도하고 2004년 다시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헌재 전 장관은 경제수장의 자리를 전투를 치르는 장군에 비유했다. 그는 “지나고 보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전투를 치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전략을 짜더라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장에서 노력을 받아주지 않으면 허허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직설적으로 현 청와대를 비판한 이는 1999년부터 3년간 경제 컨트롤타워를 이끈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진 전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탕의 하나는 당시 대통령과의 소통이었다”며 “대통령이 말씀해도 경제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니라고 했고, 대통령도 경제팀이 책임지라고 힘을 실어줬다. 산하기관장 인사 하나 못하는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규성 장관을 모시고 서별관회의에서 자주 만나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면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다”면서 “(정치권이) 서별관회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를 문제 삼아야지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공직자가 혼이 없어 최순실 예산을 지원해줬느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기업들이 국세청·검찰·관세청·정치권에 휘둘리는데 정치권력의 족쇄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는 시스템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