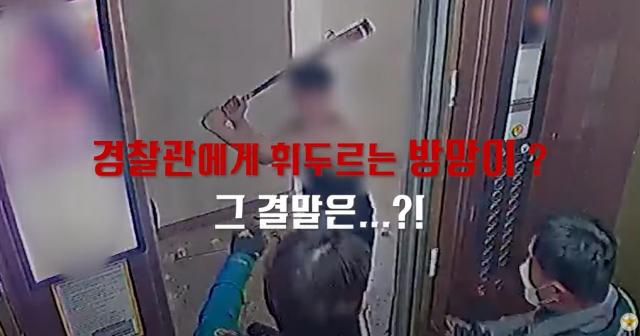1924년1월25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샤모니. 이탈리아·스위스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서 최초의 동계 올림픽이 열렸다. 16개 국가, 258명이 참가한 선수단은 2월5일까지 16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나 행사를 주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대신 ‘국제 동계 스포츠 주간(International Winter Sports Week)’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반대 탓이다.
상위권을 석권(1·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전체 메달 49개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9개를 쓸어갔다)한 북유럽 국가들이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거부한 이유는 간단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겨울 운동, 특히 노르딕 스키 종목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다. 당연히 각종 국제대회 개최도 거의 독차지했다. 스키며 빙상 경기를 중심으로 동계 올림픽을 신설하는 방안 자체에는 찬성해도 개최 장소는 북유럽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피겨스케이팅이 채택된 4회 런던 올림픽(1908) 이후 동계 올림픽을 열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 때마다 북유럽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결사 반대에 나섰다. 대안으로 나온 게 하계 올림픽의 서막으로 동계대회를 열되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방안. 절충의 산물인 샤모니 대회가 뜻밖의 성공을 거두자 IOC는 설득에 나섰다. 북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 동계 올림픽을 정기화하고 샤모니 대회를 제1회 동계 올림픽으로 간주했다.
어정쩡한 출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단절에도 동계 올림픽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참가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북반부 국가들이어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참가하려는 나라가 늘어났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22회 동계올림픽에는 88개국 2,873명의 남녀선수가 98개 세부 종목에 출전했다. 덥고 습한 열대의 나라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bobsleigh·2인승 및 4인승 썰매 경기)팀을 꾸려 동계올림픽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1993년 개봉작 ‘쿨 러닝(Cool Runnings)’처럼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도 참가하려 애쓴다.
저변이 확대되며 유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2022년에 열릴 24회 대회는 중국이 개최권을 얻어 간 가운데 25회 대회에는 중동국가들도 유치전에 나설 기세다. 열사의 지역이지만 초대형 실내 경기장을 지어 동계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동계 올림픽에서 마케팅 혈전을 벌이고 있다. 부자이어야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많고 시청자들의 구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직간접 홍보에 나선다. 점프를 마치거나 활강을 마치자마자 선수들이 서둘러 스키를 어깨에 걸치고 사진을 찍는 간접광고도 동계 올림픽을 통해 선보였다.
올림픽의 상업화 논란 속에 개최에 들어가는 돈과 후유증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소치 대회를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퍼부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설한 경기장 재활용 방안에 러시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공적이었다는 2010년 밴쿠버 대회도 실은 적자라는 논란이 없지 않다. 1998년 나가노 대회는 신칸센 등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남겼다. 그럼에도 각국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각종 인프라 건설과 국가 브랜드 상승 등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강원도 평창이 3수 끝에 2018년 24회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 대회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온갖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붕이 없는 개폐회식 장소와 시설 미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앙정부의 지원 등 취약점에도 어렵게 꾸려가던 대회 준비가 흔들리고 있다.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이 평창 올림픽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보도와 정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한국은 모든 것을 잃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환경 복원, 경기장 재활용은 물론, 수지 타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을 소지도 크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국가 지도자가 난국을 자초한 꼴이다. 이대로라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유치만 하면 18조원 경제 효과에 27만명 고용을 유발한다던 인천 아시안게임은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낳았다. 경기장 유지에만 매년 백억원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위기다. 다음 동계 올림픽 개최 장소가 베이징이어서 평창이 각국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하나만 빼고는 악재 투성이다. 주무부처의 장관도 구속된 마당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대권 후보들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동계 올림픽은 그 출발점부터 갈등과 타협의 정신이 스며 있다. 보여주기식 국제대회 유치와 운영 논란도 일단 접어두자. 좋든 싫든 세계의 이목이 쏠릴 평창 동계 올림픽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