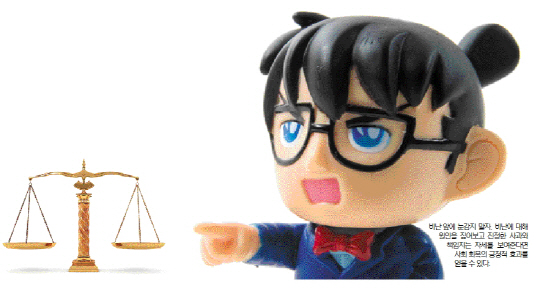‘뉴욕타임스’ 일 년 치를 두고 ‘비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1만 1,000천 가량,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기사가 나온다는 저자의 말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서 ‘비난’을 검색했다. 160만 건 이상의 뉴스가 검색됐다. 최근 1개월 치는 1만8,000건이며, 거의 매 시간 ‘비난’을 담은 기사 수가 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난이 우리 일상 깊숙이까지 스며있다는 뜻이다. ‘비판’이 옳고 그름을 밝혀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어감을 갖는 데 비해 ‘비난’(blame)은 남의 잘못과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한다는 뜻에서 부정적 느낌이 강하다. 중세의 마녀사냥부터 동성애자·소수 인종·난민 등 다수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탓을 타자로 돌리기 위해 ‘비난’을 이용했던 역사도 있다. 비난은 “상대방에 대한 추궁의 언어이자 자신에 대한 보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은 비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뜨리고 그 순기능을 짚어준다. 비난을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말을 꺼낸 저자는 “비난은 부드러운 언쟁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주는 일일 수 있으며, 결혼생활을 깨뜨릴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중요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도 있고, 막강한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정부를 뒤엎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학살을 정당화 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했다.
비난은 힘없는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 같은 거대 권력에 맞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인 만큼 저자는 “비난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비난의 중요성과 가치 등에 대한 답을 특히 심리학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발전적 비난의 대상은 주로 정부나 기업이다. 저자는 이들이 자신의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할 책무에 해당하는 ‘설명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사람과 환경을 돌보고 자사 평판을 중시하는 식으로 애쓰는 것은 “비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사전에 꺾고자 한”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한다.
책은 건강한 비난이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난사회를 넘어 ‘회복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로 비난받았고 이를 본인이 인정했을 때는 ‘사과’가 건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적시에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 수 있다”는 저자는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의 모양새는 취하되 정작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비(非)사과성 사과’나, 과거사에 대한 현재 국가수반의 형식적 사과 등을 지적한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써뒀다고 한다. 존 F.케네디 대통령도 쿠바 피그만 침공의 실패에 대한 비난 앞에 모두 자기 책임임을 강조하며 사과했다. 저자는 △국가지도자들의 사과 △정치계에 만연한 거짓 사과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올바른 자세 등을 세심하게 짚어주며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거부나 회피가 아닌 책임지는 자세와 사과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1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