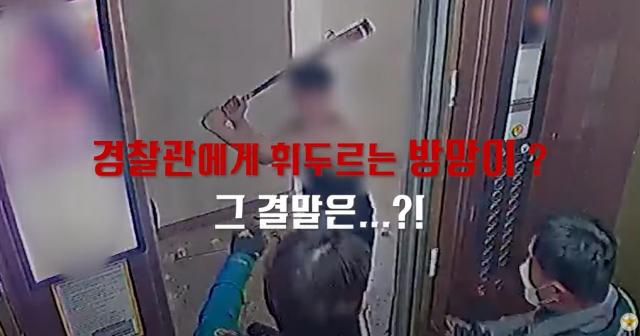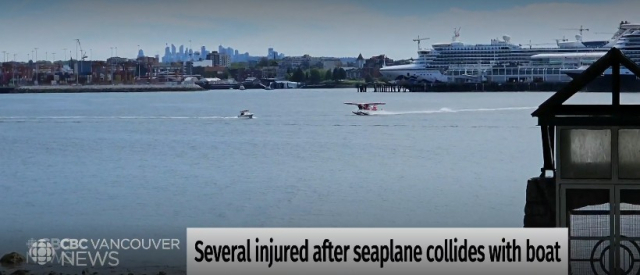사회생활의 절반을 기자로 살았다. 글 쓰고 말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후 이내 풀이 죽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좌절했다.
우리 제품을 알리려고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열었다.
“그래도 글은 자신 있다”고 호기를 부리며 글을 올렸다. ‘좋아요’ 한 개 얻는 것도 힘들었다. ‘악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무플’이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대표님 글은 너무 어려워요.” 학교를 막 졸업한 마케팅팀 막내 직원이 메신저로 비수를 꽂았다.
“대표님, ‘ㅇㄱㄹㅇㅂㅂㅂㄱ(이거 레알 반박불가)’라고요. 대표님 글이 우리의 말과 너무 달라요. ‘ㅃㅂㅋㅌ(빼도 박도 Can’t)’라고요.”
그날 이후 회사 SNS 계정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직원들이 쓴다. 글의 취지만 말해준다.
곧 변화가 왔다. SNS 페이지에 ‘좋아요’가 달렸고 활기가 돌았다. 문법이나 맞춤법 관점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학교수인 선배의 부탁으로 경제학 수업을 듣는 2학년 강의실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신문 읽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전혀 없다. 선배에게 깜짝 놀랐다고 말했더니 당연하다는 표정이다. “우리 때와 달라. 어렵고 긴 문장 못 읽어. 신문 읽을 시간도 없어. 학점 따서 취직하기 바빠.”
단절이다. 언어의 단절, 생각의 단절, 철학의 단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섬처럼 쪼개져 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쪼개짐을 이어 붙여야 하지 않겠나. 우리 고객이 청년인 것은 인정한다. 그들의 말로 홍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장사할 수 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한다고?
지난 몇 개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명쾌하게 말하지 못했다. 광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 그들의 언어로 욕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지금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먼저 다가가자.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상대의 언어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훨씬 덜했으리라. 정명수 파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