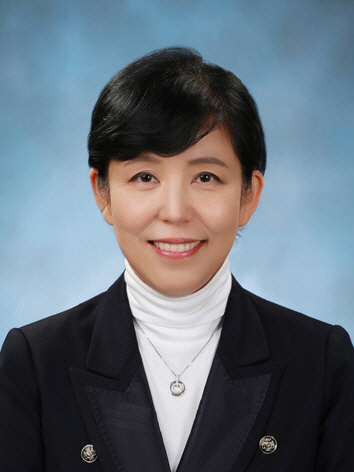탑골공원은 3·1만세운동의 발상지로서 민족적 성소다. 탑골공원의 역사적 상징 아래 여러 동상이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성대한 제막식이 열리곤 했다. 한때 자리를 차지했으나 이제는 사라진 세 기의 동상은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사회·교육 운동가인 김창제는 지난 1929년 11월2일 우연히 탑골공원을 방문했다가 높은 대좌 위에 우뚝 선 커다란 동상을 봤다. 철망을 둘러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한 그 동상의 주인공은 보름 전쯤인 10월16일에 제막식을 가진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자 일제시대 금융업계의 대부인 메가다 다네타로(1853~1926)였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조선인의 무지몰각함을 개탄한다’고 적은 인물이다.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일본인의 동상이 선 것을 좋아할 이는 없었고 결국 동상은 이듬해 금융조합연합회 앞뜰로 이건됐다. 동상이 건립된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첫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동상은 일제의 금속공출이 진행되던 1943년에 헌납돼 사라졌다.
1960년 4월25일 미술평론가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탑골공원에 섰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새끼줄에 묶여 종로통을 지나는 모습을 봤다. 1955년 성탄절에 ‘대통령의 80회 생신을 기념해’ 제막하기로 했던 이 동상은 주조가 원활하지 못했는지 이듬해인 3월31일에야 제막됐다.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국내에서 본 일이 없었기에 당대인들은 양복 입은 대통령 동상을 보고 “조국광복을 위해 해외에서 갖은 풍상을 겪은 모습을 상기”했다. 3·1운동에 관여한 이유로 탑골공원에 섰던 이승만 동상은 4·19혁명 직후 민중에 의해 끌어 내려졌고 흑백사진 속에서 바닥에 누운 동상으로 기록됐다.
5·16군사정변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탑골공원에 세운 3·1독립선언기념탑은 1980년 어느 날 삼청공원 구석에 쓰레기처럼 쌓인 채 발견됐다. 한복차림의 남녀노소가 궐기해 태극기를 흔드는 3.7m 높이 동상이 포함된 이 탑은 3·1절이 다가올 때마다 ‘대한뉴스’에서 클로즈업되며 애국심을 고취하던 작품이었으니 놀라움은 컸다. 1979년 3월에 서울시가 ‘탑골공원 정비계획’에 들어가며 “공원의 주축을 이루는 팔각정과의 공간배치가 어울리지 않고 동상의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낡아 재제작이 불가피하며 독립선언문이 원본으로만 표기돼 있어 한글과 영문판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어” 철거했다는 것인데 경제개발·국제교류 등 개발이라는 이름의 자본침식이 이뤄지던 시대였다. ‘독립선언문’을 외국인이 읽지 못하므로 조형물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욕망으로 세워진 동상은 그 욕망의 무게로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고 영원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대상조차 욕망의 장애물에 걸려 깨져 거적을 덮어야 했다. 역사에 영원을 꿈꾸는 욕망은 어떤 모습이든 완전하지 않음을 탑골공원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