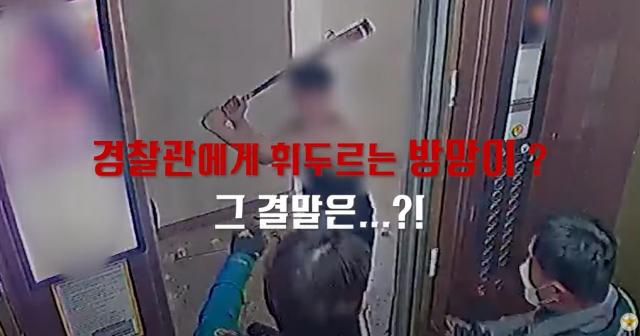중국어 ‘물건(東西·dongxi)’의 다른 말 ‘우(物·wu)’의 사전적 풀이는 생략한다. 그러나 물건 물(物 ) 자가 왜 소우 변(牛)에 말 물(勿) 자를 썼는지 알 필요는 있다. 사람에게도 ‘물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이 낳은 위대한 고승 후이넝(慧能·638~713)이 자신을 찾아온 한 남자에게 묻는다.
“썬머우 쩌머라이(뭐하는 물건(物)인데 이렇게 왔느냐).”
사람에게 ‘물건’이라고 표현함이 그다지 어설프지 않다. ‘썬머’와 ‘쩌머’는 문어체가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구어체 언어다. 구어체가 요즘뿐만 아니라 1,300여년 전 후이넝 때도 으레 쓰였다. 그리고 선어록에는 문답의 많은 부분이 구어체로 기록돼 있다.
이들 구어체로 된 문답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문어체로 풀면서 구어체가 갖는 솔직하고 구수한 맛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스님들이 ‘시썬머(뭘까?)’ 화두를 놓고 ‘이 시(是), 심할 심(甚)…’하면서 한문으로 푸는데 이는 중국어를 한두 시간만 공부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구어체 언어다.
그냥 ‘뭘까’라는 뜻으로 알고 ‘시썬머’로 발음한다. 소리(sorry), 오케이, 생큐로 답할 때 낱낱이 뜻을 생각해가면서 답하지는 않는다. 워낙 익숙한 단어들은 저절로 나온다. 옛 선사들이 ‘헤아리지 말라’고 다그침은 구어체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한 말들이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어 ‘감수광’ ‘혼저옵서예’ 따위를 문어체로 풀거나 전라도 지방어 ‘아따 성님’, 충청도 사투리 ‘왔슈?’, 경상도 구어체 ‘어서 오이소’, 강원도의 ‘우티게’ 따위를 문어체로 읽고 풀어나가려면 맛이 잘 나지 않는다.
옛 선사들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문답도 구어체로 읽고 구어체로 느껴야 오간 문답의 뜻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아무튼 사람을 두고 물건이라 한 예는 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다. 아예 ‘인물’이라는 말로 끼워 넣는다.
예전에는 사람과 가까운 것으로 말이나 소(牛)를 내세웠다. 하지만 말은 일반 백성들이 칠 수 없었으나 소 치는 일은 누구나 가능했다.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까. ‘백성 민(民 )’ 자가 어디서 왔을까. 소에 메어 논밭을 가는 쟁기에서 왔다. 성씨 씨(氏)에서 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백성 민民 자는 농기구로써 밭을 가는 쟁기의 그림문자다. 백성의 일은 농사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일꾼 소가 물건 중에서는 대표적이었기에 소우 변(牛)에 소릿값 말 물 자를 붙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말 물(勿) 자였을까. 소가 지닌 갈기와 터럭과 뚜벅뚜벅 걷는 네 개 다리다. 또 말 물(勿) 자는 얼룩소를 의미한다 하는데 농사짓는 데 얼룩소보다 황소가 어울리지 않을까. 물(物)이라는 글자가 보편적이듯.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물건 물(物)’ 자와 ‘부처 불’ 자가 같이 쓰인다. 흙토 변(土)에 갈고리 구(勾) 자가 붙어 있는 부처 불자로서 흙으로 빚은 불상이다. 우묵할 요, 물건 물 자로도 새기는데 부처 불(佛) 자와 물건 물(物) 자와 같다. 부처 불(佛)은 ‘일어날 발’ ‘도울 필’로도 풀이된다.
부처는 흙을 떠나지 않는다. 부처는 땅의 중생과 늘 함께한다. 땅(土)의 언어(勾)로 말씀하시니 대지가 그대로 온통 부처님이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지난 1972년에 발표한 가설의 논문 ‘대기권 분석을 통해 본 가이아 연구’에서 밝힌 가이아 이론과 일치한다. 부처 불 한 글자에 가이아 이론의 가설이 다 담겨 있다.
내가 내게 묻는다.
“아, 나는 어떤 물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