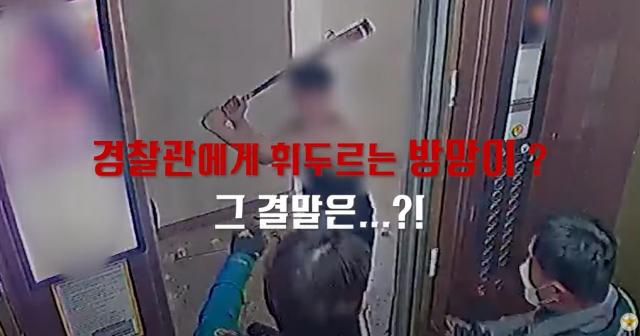스타트업 A사는 지난해 9월 신발 브랜드 ‘IOFIT’ 출원을 두고 외국계 회사인 B사와 수개월 간의 치열한 공방을 시작했다. 당시 B사는 A사가 상표 출원한 ‘IOFIT’이 자사 상표인 ‘IQ FIT’과 유사하다며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냈다. 상표의 외관이 오인·혼동될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발음상 4음절 중 3음절이 같아 호칭이 유사하다는 점도 이의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한 자사 상표가 이미 출원 등록된 만큼 A사의 상표 출원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었다.
A사 관계자는 “B사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IOFIT 상표 출원을 담당한 특허사무소를 통해 알게 됐다”며 “빠르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회사가 입주해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해결 방안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A사는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고 이곳에서 승진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A사 법률 자문을 맡은 이 변호사가 특허청 이의심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시한 것은 양사 상표가 외관·관념·호칭 등에서 오인·혼돈할 정도의 비슷한 점이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 3가지 관점에서 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pantac’와 ‘zantac’은 첫소리가 현저하게 다르다며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지난 2009년 2월과 2005년 4월 판결에서 각각 중·종성의 발음이 차이가 난다며 비슷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또 2008년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로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발음상 한 음절만 다르거나 외형상 점과 동그라미 등이 추가돼 두 상표 간 식별이 가능할 경우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판례를 통해 상표 간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전략은 100% 적중했다. 특허청은 5월 “앞서 등록한 IQ FIT과 출원상표인 IOFIT이 호칭·외관상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O’와 ‘Q’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영문 철자라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IQ FIT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IOFIT은 공백 없이 같은 간격으로 기울어져 배치돼 있다는 점도 B사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요인으로 꼽았다. 외관이나 호칭 상의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게 특허청 이의심판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셈이다. 결국 A사는 5월 IOFIT에 대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2015년 11월 처음 상표를 출원한 지 1년 6개월 만의 쾌거였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외관이나 관념, 호칭 등에 대한 인식 없이 상표권을 출원할 경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며 이들 3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상표법상 제2조(정의)와 제34조(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상표 출원 전 반드시 인지해야 할 법률 조항으로 꼽았다. 상표의 정의는 물론 등록 불가 요인과 침해 행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등록에 실패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상표법상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한다. 특히 상표법에서는 앞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 소비자 기만 등의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타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비슷한 상품에 쓰거나 위조 및 모조의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해 교부·판매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