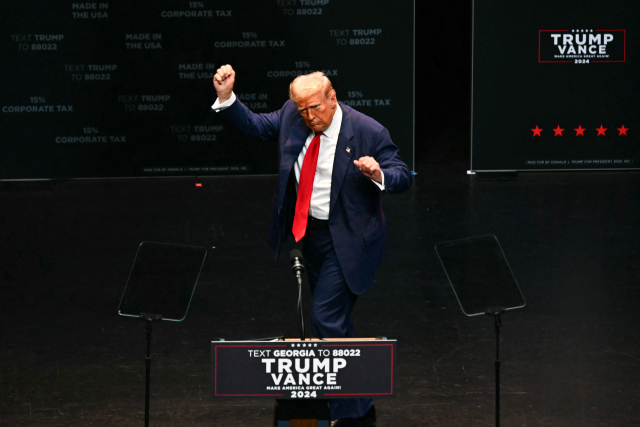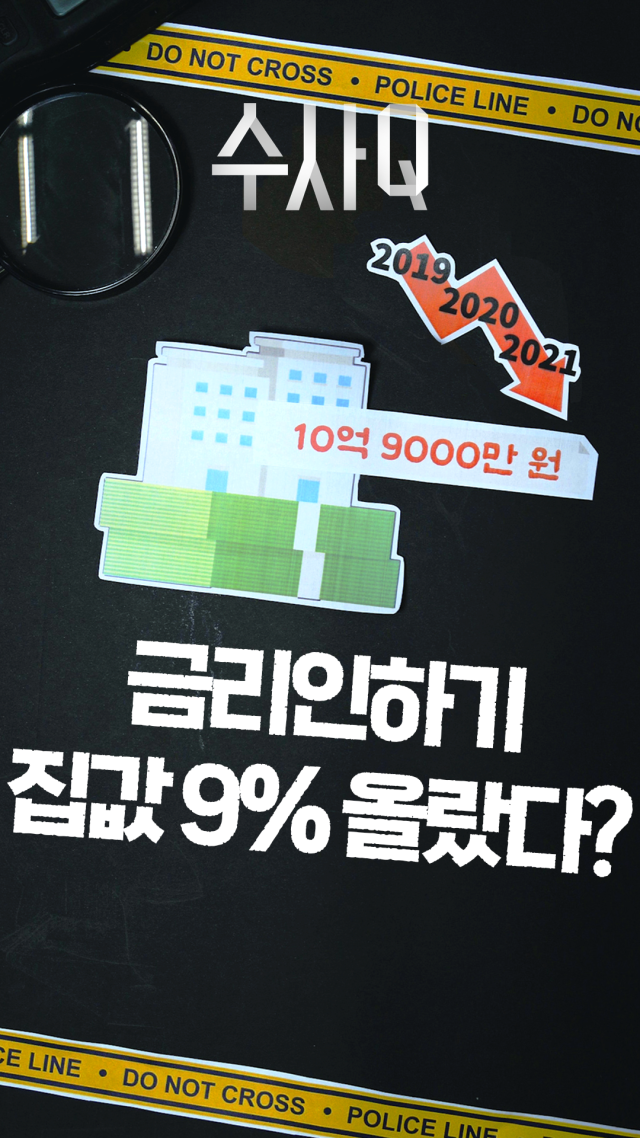현실도피적 자살행위.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던 꽃다운 소녀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오늘날까지도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사연이다. 이 안타까운 소녀는 뛰어내리는 순간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다음달 8일부터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에서 심청 역을 맡은 장서윤(26)은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던 심청은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당수에 뛰어내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연에서도 당당하게 급식체(급식 먹는 중·고등학생이 쓰는 말투)로 “인정? 어 인정! 나 현실 도피했어요”라고 외치게 될 젊은 소리꾼을 서울경제신문이 만났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심청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깊은 효심의 아이콘인 심청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바친다는 이야기다. 장서윤은 심청의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젖동냥까지 해주며 키웠다고 하더라도 심청이 홀로된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은 아직 어린 심청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으로 보인다”는 그는 “사실 이제는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내려도 용왕이 구해주고 중전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원래 그 행위는 자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주위에서 말리기는커녕 ‘효심이 깊다’며 뛰어내릴 것을 부추기는 상황이 더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부문 금상 수상을 비롯해 창극 ‘미녀와 야수’, 여우락 페스티벌 ‘아는 노래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그도 마당놀이는 처음이라고 했다. 마당놀이의 매력에 대해 “이만큼 사회 풍자하기 좋은 수단은 없는 것 같다”며 “마치 서양의 힙합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뚫고 나갈 수 없는 현실을 디스(힙합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동 혹은 노래)하고 비판하는 점이 힙합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그는 “무대 역시도 일반적인 극은 프로시니엄이라 해서 정면만을 의식하는 반면 마당놀이는 모든 면이 뚫려 있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관객이 상대 관객 표정도 볼 수 있다”며 “마치 쇼미더머니(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던 무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악인 집안도, 음악가 집안도 아니다. 그런 그가 7세에 판소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피아노 선생님 덕분이라고. 당시 다니던 피아노학원 선생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던 유미리 소리꾼을 소개해줬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장서윤은 “일곱살에 국악을 시작했다고 하면 ‘아 남도에서 왔나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서울 불광동 출신입니다”라며 웃더니 “판소리를 한지 20년이 됐는데, 마냥 재밌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급식체에 빠져 있다. 전통을 상징하는 판소리와 어린 학생들의 가벼운 급식체가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장서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판소리의 묘미는 아니리(판소리 창자가 일정한 장단 없이 자유 리듬으로 사설을 엮어가는 행위)입니다. 급식체를 표현하기에 제일 적당한 장르에요”라는 그는 이번 마당놀이뿐 아니라 조지 오웰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직접 개작, 작창해 다음달 1일과 2일에 아라리오 뮤지엄 소극장에 올리는 ‘장서윤의 판소리 - 동물농장’에서도 급식체를 사용한다. “(급식체가) 너무 웃겨서 자꾸 생각이 난다. 빠져나올 수 없다”고 웃은 그는 이번 마당놀이를 보러 올 관객들께 남길 한마디도 급식체로 남겼다.
“마당놀이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보고 가시기에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인 작품 제가 인정합니다. 연말연시에 마당놀이만큼 온 가족이 즐길 작품 있다면 나와보라 하세요. 좋은 한해 마무리와 힘찬 한해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뻔한 말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니까요.”